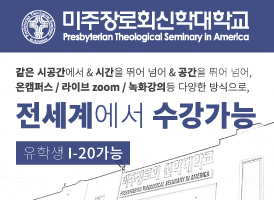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박미영칼럼] 아버지
미국은 어머니 아버지 날을 구분 지어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킨다.
어느 1세대 지인은 성인이 되어도 엄마의 단어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빠라고 소리치며 어리광 부린지가 언제였던가 하며 떠나간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특히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는 가장, 권위, 책임, 부양, 소처럼 일하는 사람, 눈물 없는 사람 등이 떠오른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다 지금은 성공이란 배지를 달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아버지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어떤 이는 '내 마음속의 묵직한 자물쇠 같은 존재'라고 아버지를 표현한다.
소처럼 튼튼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백발의 나약한 모습에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한다.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괜스레 찡한 마음부터 든다.
지금의 한인사회가 성장 발전한 이유는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의 성실하고 고단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2, 3세들은 무능한 이민 1세대들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1세대들이 경제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녀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이어온 교육의 귀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이다. 어떤 2세 젊은 청년이 했던 말이 아버지날이 다가올 때면 귓가에 맴돈다. "자신의 정체성은 곧 아버지의 삶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날에 가장 드릴 수 있는 효도는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드린다."라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 아비가 누군지 참 잘 키웠네" 주위 사람을 흐뭇하게 했다.
이처럼 "자식 참 잘 키웠네" 이 말을 듣기 위해 우리네 아버지들이 여태껏 타국에서 겉돌았던 이방인으로 소처럼 일한 것이 아니었나 나는 과연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