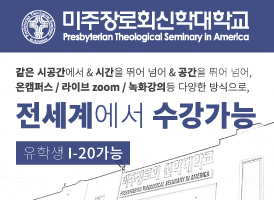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박미영칼럼] 보름달
어릴 적 아버지가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면 일제히 형제들을 세워 놓고 소원을 빌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소원이라는 말에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같은 기대감에 갖고 싶은 리스트를 산타에게 구애하듯이 마구잡이로 빌었다. 지금도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 둥근 보름달을 보면 설렌다. 어릴 때는 소원이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할지가 항상 행복한 고민이었다.
유독 한국은 한가위 보름달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 민족의 농경생활과 달의 연관성과 연결되어 예로부터 선조들은 추석 저녁 보름달을 보며 수확에 감사하고 풍작을 기원했다. 동양에서는 유독 달이 풍요와 소원을 비는 이미지가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보름달을 통해 가슴속 품어왔던 못 이룬 꿈과 풍성함을 느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요즘 들어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풍성한 결실을 내려준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 간 사랑을 나누는 데 참뜻이 있다. 특히 이국땅에서 추석을 맞이할 때면 고향과 그리운 가족들의 추억이 떠오른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보름달 같은 둥근 심성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단한 추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한가위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길 바란다. 여유롭게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빈다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게 비춰질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는 일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길 바란다.
성인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나는 보름달을 보면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하나, 이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또 다른 설렘이 앞선다. 모두 마음속에 품어온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