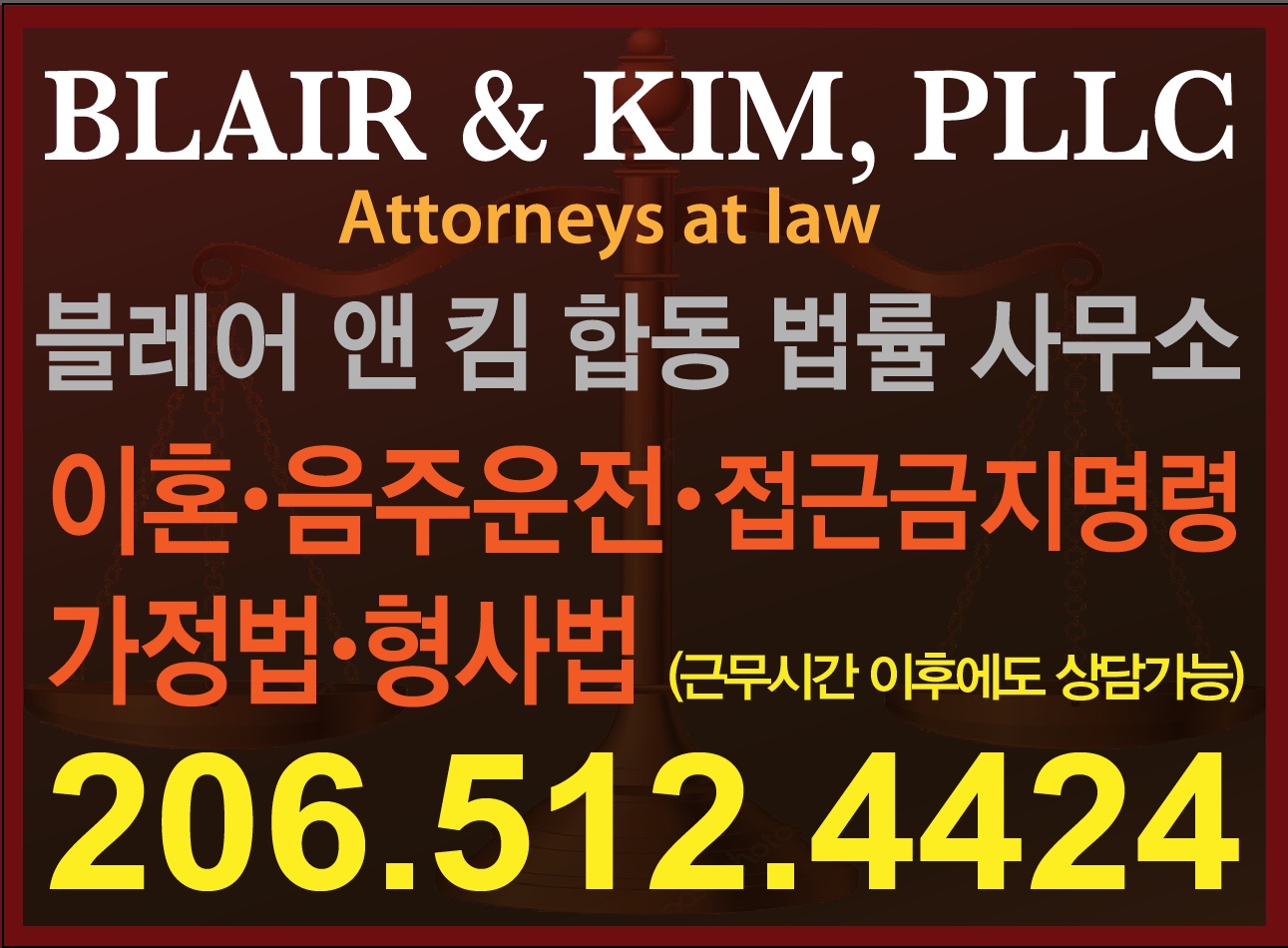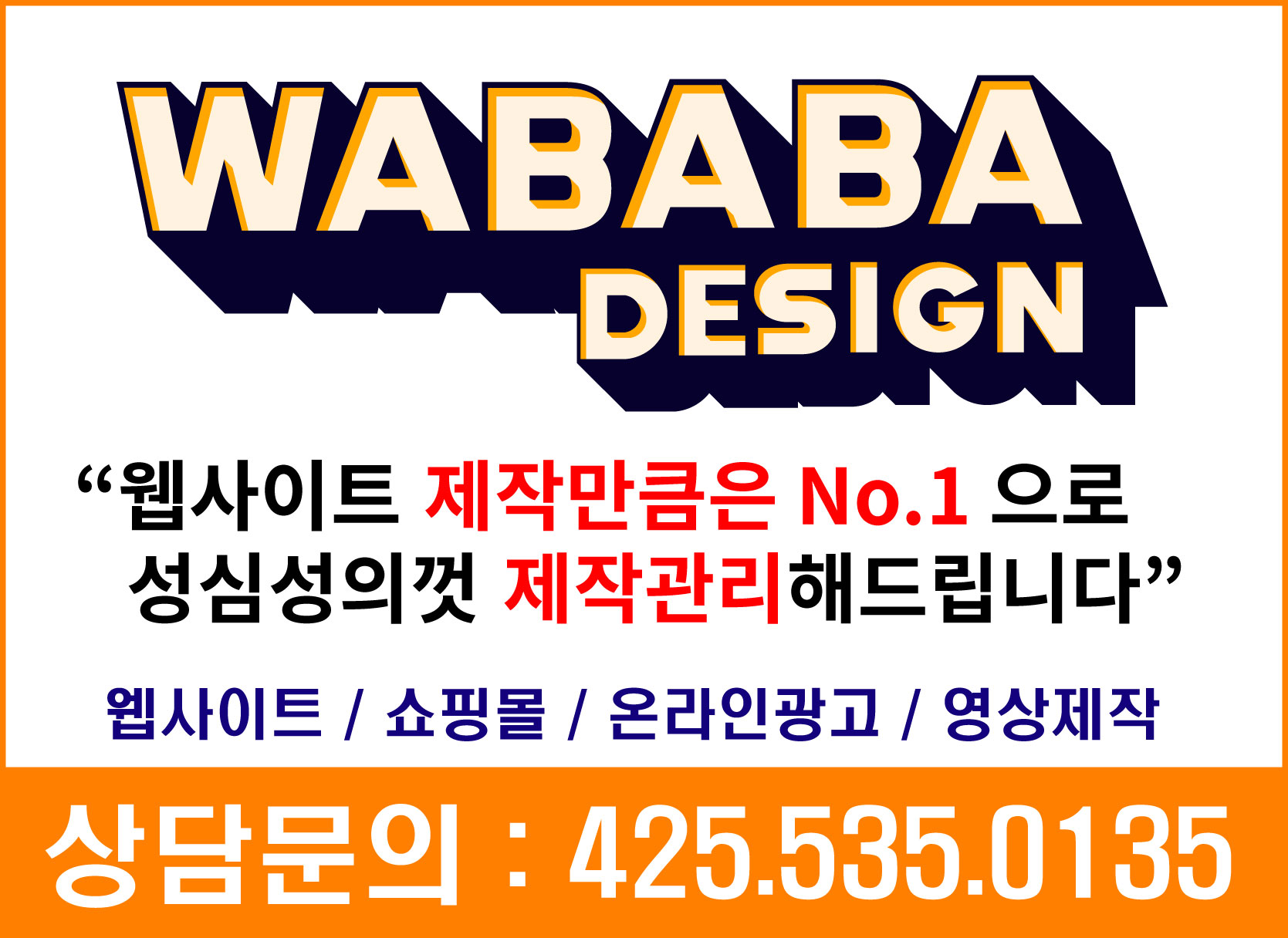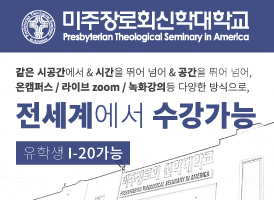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안상목회계칼럼] 헬리콥터 화폐
헬리콥터 화폐는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로 인하여 세상의 관심을 끌었으나, 그 용어의 창조자는 벤 버냉키의 스승 밀튼 프리드만이었다 한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의 일이다. 그로부터 40년 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69년은 미국이 아직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였다. 그 해에 발간된 밀튼 프리드만의 저서 “최적화폐량(The Optimum Quantity of Money)”이라는 책자에는 13개의 논문이 실려 있고, 그 중 첫번째 논문의 제목은 그 책의 제목과 같다.
그 논문의 요지는,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화폐를 뿌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의 화폐수량설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금본위제가 아닌 지금의 화폐제도에서 화폐수량설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칼럼 410호(화폐의 생멸) 부터 칼럼 423호(프리드만의 화폐수량설)까지 14개의 칼럼에서 철저히 파헤쳐졌다. 그렇다면, 금본위제에서는 프리드만의 화폐수량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까?
금본위제에서 정부가 헬리콥터로 뿌려줄 돈을 만들자면, 재무부 보유의 금덩어리를 연준에 갖다주고 연준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충분히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가 그 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주면, 재무부 소유에서 연준 소유로 옯겨진 금의 가치만한 돈이 추가로 세상에 나가 있게 된다.
시중에 금의 공급이 많아서 금의 가치가 내려가거나, 일반 물자가 부족해져서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어지면, 물가는 올라간다. 금의 공급이 많다는 것은 금이 많이 채굴되었다는 뜻이며, 위의 헬리콥터 모델에서처럼 재무부 소유의 금이 연준 소유로 이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칼럼 491호(16세기 스페인과 닉슨 쇼크)에서 언급된 바, 16세기 스페인에는 신대륙에서 대량의 금이 채굴되어 스페인으로 몰려들었다. 위 헬리콥터 모델은 그러한 일과 연결되지 않는다.
시중에 금의 공급이 많거나 일반 물자가 부족하면 물가는 올라간다. 앞 문단에서 본 바, 헬리콥터 화폐와 금의 공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헬리콥터 화폐의 이론은 지금의 화폐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헬리콥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새롭게 출현한 상품이나 써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남아 도는 기존 제품을 더 사는 경우는 이성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오랜 대공황동안 포드 자동차는 줄곧 적자를 겪었지만, GM은 처음 한 해만 적자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흑자를 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포드는 새로운 스타일의 자동차 수요를 잘 잡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기존 제품들의 가격 추락은 전체적 디플레이션 계산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제품의 수요가 일어나도 기존 제품 가격 추락을 막을 길은 없으므로, 헬리콥터 화폐로 인한 총제체적 구매력 증가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은 이 두 회사의 비교에서 명백해진다.
구매력 증진으로써 기존 상품과 써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단지 구매력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는, 말하자면 합리적 분배정책이다. 헬리콥터 화폐는 아무에게나 돈을 보내는, 무차별적 분배 정책이므로, 여기해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공황의 디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것의 재생산을 지양하고 남는 생산력을 새로운 것에 투자해야 했다. 또, 그것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합리적인 분배정책으로써 인간이라는 자본을 살려 두어야 했다. 그것이 뉴딜 정책이었다.
프리드만의 헬리콥터 화폐는 자신의 화페수량설에 대한 맹신에서 온 경박한 주장이다. 이 황당한 생각의 사슬의 실마리 하나가 이 글 첫 문단의 저서 제 5페이지에서 발견된다.
One man can spend more than he receives only by another to receive more than he spends. (갑이 입수하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려면, 을이 쓰는 돈보다 입수하는 돈이 더 많아야만 한다.)
위의 표현은, 한번 세상에 나온 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칼럼 556호(화폐 소멸과 비트코인)에서 검토된 바, 민간 은행차입금 상환, 중앙정부의 세금 및 공과금 징수, 민간인의 국채 매입 등 세 가지는 화폐를 소멸시키는 거래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도, 사람들이 그 돈을 주워서 빚을 갚아버리면 늘어난 그 화폐는 그대로 소멸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주운 사람의 빚이 줄어들고 돈을 뿌린 주체의 빚이 늘어날 뿐, 다른 변화는 없다.
화폐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단히 그릇된) 상상은 지난 몇 주 동안 줄곧 주제 삼은 화폐발행이익 개념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