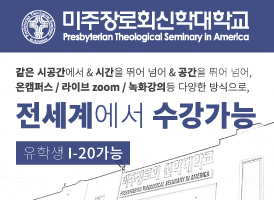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정병국칼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2)
<지난 호에 이어>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스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정성껏 빨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고루 씻어주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분명히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어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치없이 한 번 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기는 것을 바랐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의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중략)
맹 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녹여주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손을 대어 만져주며 그 사랑으로 녹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단단하게 빗장으로 잠겨 있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셨고 빗장이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맹 선생이 지켜주시는 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맹 선생이 함께하시는 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을 때 통탄했습니다. 이 낯선 땅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왜 포로로 남겨져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맹 선생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우리들 몇 사람은 기쁘고 신기한 놀라움에 이따금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합니다. 중공 땅에서 복음이 지워지고, 그 담장이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높고 두꺼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밀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총부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들이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무어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되는 날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다 선생께서 석방되시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인 자정이 넘은 시각에 오셨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찬송가를 베껴 쓴 종이를 나누어 주시고 종이말이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머리에 꿇어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중 환자들한테 가서는 얼굴 씻고 발 씻는 일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중국어)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 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모두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낼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먼 곳,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시듯 높은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스물여섯의 꽃 같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 철이 들면서부터 민족 해방의 오열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전쟁으로 이어진 비극 속에서 그는 예수님보다도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큰 입을 열어 떠들었다. 맹의순의 삶에 비하면 지금의 내 삶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복이 넘친 현실인데 그래도 시간을 탓하며 주님 사업에 소홀히 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사죄할 뿐이다.
큰 매를 맞기 전에 나도 하나님과 약속한 내 남은 삶의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보련다. 내가 홀로 우뚝 서는 그날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잔이 넘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