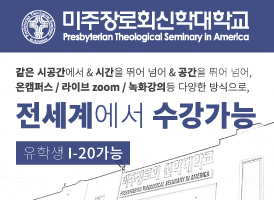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박미영칼럼] 좋은 엄마
잔소리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는 엄마가 아닐까 싶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시대를 막론하고 엄마의 잔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반면 그저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묵묵히 채워주는 그런 엄마가 과연 좋은 엄마일까. 인간이 입술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름은 '우리 엄마'로 어머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큰 바위 같은 힘이 있다. 동시에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의지하고 싶은 존재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일에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내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고 사랑이라는 정의로 자식을 마냥 대하기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많다. 내리사랑과 냉철함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도 엄마의 의무이기도 하다.
내 자식이 인성적으로 흉지지 않기 위한 엄마의 노력은 품안의 자식에서 사회의 자식으로 출가시키는 기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엄마가 딸에게 꿈을 묻자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며 고작 그게 꿈이냐고 웃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 엄마라는 직책이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엄마의 위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인생의 희생이 아니라 기회이다.
엄마라는 위치는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훈장과도 같다.
그래서 다 늙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나약한 병든 존재라도 당당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든든한 엄마 방패막이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한다. 엄마의 곁을 떠나봐야 그 방패막이 얼마나 든든한 빽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어떤 누구도 엄마가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성이 된 나이가 되어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견디는 법을 알지 못한다.
대단한 능력을 갖춘 슈퍼맘이라고 반드시 유능한 엄마가 아니다.
필요한 시기에 언제나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일 것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가화만사성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평범하지만 가장 어려운 진리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특히 엄마의 품에서 느끼고 시작된다.
엄마의 날을 맞아 나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엄마'의 노고에 감사하며 엄마는 영원한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도 깨달아야 한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길과 따스한 말 한마디가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절실히 그리울 때 그 자리에 항상 엄마가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