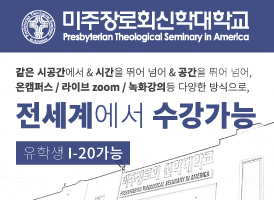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나은혜칼럼] 김현정 전도사님의 한국 정착 이야기(2)
<지난 호에 이어>
1997년 7월에 탈북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나라가 못살고 책임져 주지 못해서 그렇게 북한을 나온 북한 주민들은 제3국에서 팔려가고 매 맞고 칼로 위협당해도, 심지어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내던짐 당해도 하소연할 길 없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나와 20일 만에 월마트에 알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정착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문화의 장벽과 외래어와 영어와 약 7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그야말로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의사 전달이 안 되더군요. 예를 들면 “또 보자”라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인사말이 아닌 사실과 실제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될 때 만나 밥 먹자!’ ‘차 마시자’,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놀러 와라!’ 이런 등등의 인사들을 하는데, 순진한 탈북민들은 이 말에 많은 혼선을 갖습니다.
돈의 단위도 너무 다르고 카드, 바코드, 배달 등등의 많은 것들이 저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물물교환으로 시장에서 양식을 준비하던 북한을 생각해볼 때 과연 우리는 타임캡슐을 타고 어느 다른 별에 온 듯 했습니다. 이 외에도 좌충우돌 저의 한국정착기는 끝도 없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
아름답고 여유 있고 본인만 부지런히 살면 희망이 있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제 마음엔 늘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어려서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도 될 법한데 이상하게 그곳은 저와 맞지 않았고 탈북민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눠도 타인의 험담이나 건설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저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북한에 수많은 엘리트들과 힘센 사람들과 권력가들을 비롯한 약 300만 아사자가 발생했는데, 너는 왜 살아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공해야 한다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 이 질문을 흘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불빛이 저를 현혹한 것이 아니라, 이젠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북한에 실려 갈 것만 같은 불안한 생각으로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그때 저는 “난 이제 살았다. 이제 잡혀갈 위험도 없네. 그런데 어떻게 나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한국에 왔을까? 감사하다!”
두만강에서의 나의 첫 기도
갑자기 친정에 오면서 인질로 자청한 언니가 식량만큼이나 귀한 소금을 한 줌씩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 확실하더라. 두만강에 들어서기 전에 소금을 뿌리면서 하늘님. 우리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점쟁이도 모르고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던 나로서는 언니의 이런 행동과 말들이 믿기지 않을뿐더러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언니가 살면서 먹어야지 이 귀한 소금을 왜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라고 하냐고 했지만 언니는 기어코 주머니에 넣어주며 반복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에 나와 산에서 쪽잠을 청한 우리 가족은 새벽 4시가 되어 두만강 접선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적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딸 셋은 소금을 두만강에 뿌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봐도 간절함의 끝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있대요. 정말 있다면 우리 가족이 두만강 건너야 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두만강에 들어섰는데 물이 가슴을 넘어 높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럼 그렇지! 내 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그냥 집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차디찬 두만강 물에서 죽게 한단 말인가?”
서글픈 마음에 눈물까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안하고 정말 세 발자국 앞으로 가니 갑자기 두만강 물이 무릎 아래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았다.” 약속한 듯이 우리는 손을 잡고 중국 쪽을 향해 물길을 가르며 뛰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1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선 민가를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다섯 명 모두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그때 한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살려주시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놀라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오. 그래서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그때는 교회를 알지도 못했는데 신기하게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중국에 사는 먼 외가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한 달을 보양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얻은 마냥 행복했는데, 식구가 너무 많아 중국당국의 신고와 벌금과 북송이 기다렸기에 다섯째 언니가 시집가는 조건으로 부모님을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숙식이 가능한 닭곰탕 음식집에 취직하고 저는 역시 숙식이 제공되는 양고기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국은 땅이 넓은 만큼 사기꾼도 많습니다. 다섯째 언니가 팔려갔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은 빚이 너무 많아 부모님들은 한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없이 길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을 잡고 ‘내 북한에서 왔소. 여기 광장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를 좀 데려가 주오’ 그 아주머니는 ‘왜 그러시는데요?’
어머니의 자초지종을 들은 그 아주머니는 부모님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며 작은 옆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한 중국에서는 집사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바로 교회 책임 집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