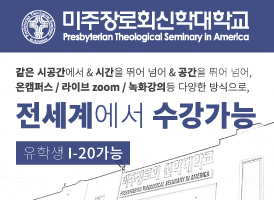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아슬란장례칼럼] 장례 이야기
“내가 나중에 죽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창한 토요일 오전, 우리 가족이 자주 즐겨 찾는 동네 Diner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다가 꺼낸 말에 두 아이는 맛있게 먹던 오믈렛을 삼키지도 못하고 “Oh No! we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 부부는 얼굴을 마주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당시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9년 전, 75세의 나이로 건강하시고 활달하셨던 어머니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성 뇌종양을 진단받으신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할머니를 잃은 아이들은 물론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현실로 가깝게 느껴졌다.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붙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질 때, 참고 있던 울음을 터트린 그 순간부터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몇 일은 마치 안개 속을 지나온 느낌이었다.
목사의 직분으로 장례를 인도하고 많은 장례식도 다녀 보았지만, 막상 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려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부모님은 미리 본인들의 장례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이 있으셨고 그 내용을 내게도 일러 주셨다. 우선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 관 속에 누운 자기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대신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조의금은 받지 말라 당부하시며, 본인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단 한 차례의 천국 환송 예배로 족하니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화장을 원하셨다.
손주들은 어디를 뒤져서 찾았는지 하루 이틀 만에 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생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멋진 슬라이드를 만들어 영상을 준비했고 그 모습들과 추억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장례는 애도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감동과 미소를 짓게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장례를 잘 치러드릴 드릴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어느덧 오십을 넘긴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게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상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밝고 캐주얼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꺼내 보았는데 막상 처음에 식겁한 반응과는 달리 일단 대화를 시작하니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사망할 경우 자기네들은 당장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 부모 없이도 자기들끼리 살아갈 경제적 형편이 되는지 등, 조금은 서운할 정도로 실질적인 질문들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어쩌면 당장 당면한 현실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라고 가정했기에 조금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다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딸과 직장을 다니는 아들에게서 그때의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사시에 엄마와 아빠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제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죽음과 관련한 대화를 가족들 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특히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상 부모님과 또 자식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꺼리게 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와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삶과 죽음의 기로를 맞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원했는지 잘 모를 때 남은 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언젠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면,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우리가 먼저 웃으며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