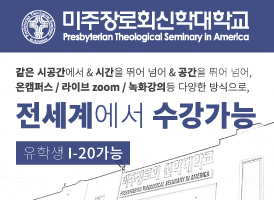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김수영의 산이야기] 141도의 뉴멕시코 사막여행
미국 50개 주 가운데 나의 42번째 주 탐방여행지로 텍사스주-뉴멕시코주를 선택한 이유는 산악회원 중 한 분이 몇년 전 텍사스주에서 시애틀로 이사 온 후, 뉴멕시코주의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버킷 리스팅의 다음 순서에 넣어두고 이번 여름휴가에 가봐야 할 곳 중에서 첫째로 뽑히게 된 것이다. 서북미 끝자락에서 중남부 끝자락으로 가는 첫날 밤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비를 아끼려고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레드아이' 항공편으로 피닉스를 경유하는 항공 티켓을 구입했는데, 피닉스에서 텍사스주 엘파소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됐다.
자정 무렵의 새까만 밤에 처음 당한 일이라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투숙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즐기며 오래전 돌아본 투산과 서도나의 추억을 되돌려 보는 휴식 시간을 얻기도 하였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은 시애틀에서 일년에 300일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를 찾은 것이다. 80도를 오르내리는 시애틀에서 노면온도가 무려 141도를 넘는 엘파소, 미졸라의 사막 기온을 체험할 수 있었다.
비행기 날개 밑으로 내려다본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은 말 그대로 나무도 산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다. 엘파소 시내를 관광하며 본 저 너머의 진짜 멕시코는 무예에 조금만 능한 사람이 훌쩍 넘어도 될 것 같이 낮은 벽과 힘없이 흐르는 리오브라보강이 왠지 슬프게 보였다.
나의 애완견 치와와의 원산지인 멕시코 치와와주와 미국 영토인 엘파소를 가르고 있는 가늘고 빈약해 보이는 강과 저 낮은 벽 넘어로 보이는 두 나라의 빈부격차를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샌디에이고와 티와나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부유와 멕시코의 빈곤은 수백 년 전부터 흘러 오는 역사적 애환이 지금도 국경을 넘어오는 눈물겨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국경수비대의 검색을 받은 화이트 샌드 길을 지나자 2억 5000만 년 전에는 얕은 바다였다는 화이트 샌드 공원의 석고가루같은 하얀 모래가 무려 275평방마일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풍화작용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하얀 모래 평지는 해발 3,996피트의 고원지대로 강한 남서풍 바람으로 모래 파도가 출렁이는 별천지였다. 강풍이 걸어온 발자국을 바로 지워버리는 황량한 모래밭이어서 돌아가는 길의 방향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갑자기 느끼는 높은 기온에 살짝 두통이 오기도 하였다.
두 시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인 땡볕 더위에 만난 하얀 모래사막에 줄지어 있는 지붕 있는 피크닉 테이블의 풍광은 너무 멋지게 보였다. 70번 도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화이트 샌드 미사일 기지를 지났다.
미항공우주국(NASA) 연구시설이 있고 공군의 핵미사일 실험장이라는 얘기에 잠시 들렀다.
머질라 멕시칸 민속촌에 들려 멕시코 원주민 음식으로 점심을 즐겼다. '텍사스!' 하면 카우보이들이 즐겨 먹는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를 건너뛸 수는 없다.
텍사스주의 맨 끝자락이자 뉴멕시코주 초입인 이곳에 홀로 덩그러니 자리 잡은 식당의 이름은 '텍사스 끝자락(Edge of Texas)'이었다.
첫날 예고 없이 취소된 비행기로 당황스러웠지만 아지랑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텍사스주 사막 한가운데서 먹는 일품 텍사스 쇠고기 맛은 '고진감래'를 느낄 수 있었던 피날레였다.
이번 여행은 재충전을 위한 일상 탈출 힐링여행이었지만, 시애틀에서 타던 겨울산 눈썰매를 멀고 먼 사막지대에서 모래썰매로 깨끗이 털고 돌아온 추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