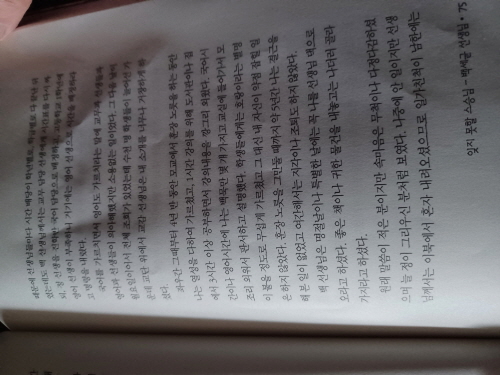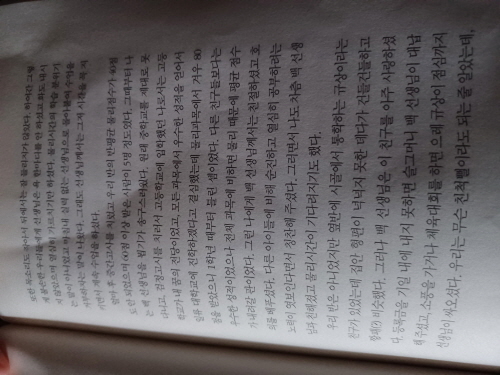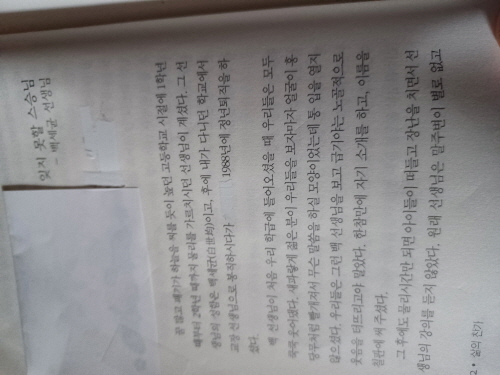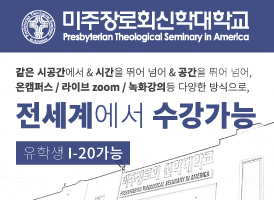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정병국칼럼] 잊지 못할 스승님-백세균 선생님
꿈 많고 패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던 고등학교 시절에 1학년 EO부터 2학년 때까지 물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의 성함은 백세균이고, 후에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시다가 1988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다. 백 선생님이 처음 우리 학급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들은 모두 쿡쿡 웃어댔다.
새파랗게 젊은 분이 우리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무슨 말씀을 하실 모양이었는데 통 입을 열지 않으셨다. 우리들은 그런 백 선생님을 보고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참 만에 자기소개를 하고, 이름을 칠판에 써 주셨다.
그 후에도 물리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 원래 선생님은 말주변이 별로 없고 또한 목소리도 작아서 뒤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여간 그렇게 불손한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욕 한마디를 안 하셨고 화도 내시지 않았으며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셨다.
물리 시간의 학습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고 마침내 실력 없는 선생님으로 몰아붙여 수업을 거부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그저 시간을 꼭 지키면서 계속 수업을 하셨다. 얼마 후 중간고사를 치렀고 우리 반의 평균 물리점수가 40점도 안 되었으며 60점 이상 받은 사람이 5명 정도였다. 그때부터 나는 백 선생님을 뵙기가 송구스러웠다.
원래 중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나로서는 고등학교가 내 꿈의 전당이었고,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일류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물리 과목에서 겨우 80점을 받았으니 1학년 때부터 틀린 셈이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우수한 성적이었으나 전체 과목에 비하면 물리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내려갈 판이었다.
그런 나에게 백 선생님께서는 친절하셨고 호의를 베푸셨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순진하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 칭찬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도 차츰 백 선생님과 친해졌고 물리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우리 반은 아니었지만 옆 반에 시골에서 통학하는 규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데다가 건들건들하고 깡패(?) 비슷했다.
그러나 백 선생님은 이 친구를 아주 사랑하셨다.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슬그머니 백 선생님이 대납해 주셨고, 소풍을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면 으레 규상이 점심까지 선생님이 싸 오셨다. 우리는 무슨 친척뻘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도 아니었다. 다만 고향이 북한 어디라고 하는데 좌우간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 못 했고, 생김새도 별수 없었는데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결국, 백 선생님과 규상이의 친분관계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선생님이 미국에 오시면 반드시 만나서 함께 며칠씩 지내고, 또 규상이가 한국에 나오면 선생님 댁에서 묵을 정도로 친숙하다. 은근히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그러나 규상이 못지않게 백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선생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다만 내가 그 반도 때를 수 없고 제자 된 도리를 못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훈장 노릇을 했는데, 어쩌다가 여자 고등학교 선생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23세였으니 아주 젊었고 물론 총각이었다.
여고 졸업반 아이들과는 겨우 4~5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다. 젊은 나이에 여학교 교사 노릇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다. 그러던 중 그 당시 서울 시내 모 여고에서 총각 선생과 여학생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여학교에서 총각 선생님들이 사직해야만 했다. 하여간 문교부 지시였는지, 교육위원회 지시였는지 모르지만 나도 부득이 물러나야만 했다.
그때 생각난 선생님이 바로 백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백 선생님은 모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고, 학교도 크게 발전하여 선생님들만도 중학교 포함하여 300명이나 되었다. 모교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여학교에서 나와야만 된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다.
그때는 이미 학기 초가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시간 배당이 학년별로, 학급별로 다 끝난 뒤였는데도 백 선생님께서는 교무 담당 선생에게 시간표를 다시 짜되, 정 선생을 진학반 국어 담당으로 배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영어 선생이 부족하니 거기에는 영어 선생으로 시간을 배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국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치라는 말에 교무과 선생들과 영어과 선생들이 의아해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다음 날이 월요일이어서 전체 조회가 있었는데 수천 명 학생이 늘어선 가운데 교단 위에서 교감 선생님은 내 소개를 너무나 거창하게 하셨다.
좌우간 그때부터 4년 반 동안 모교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 동안 나는 열성을 다하여 가르쳤고, 1시간 강의를 위해 도서관이나 집에서 3시간 이상 공부하면서 강의내용을 깡그리 외웠다.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나는 백묵만 몇 개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모조리 외워서 판서하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는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섭게 가르쳤고 그 대신 나 자신이 약점 잡힐 일은 하지 않았다. 훈장 노릇을 그만둘 때까지 약 5년간 나는 결근을 해 본 일이 없었고 여간해서는 지각이나 조퇴도 하지 않았다. 백 선생님은 명절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나를 선생님 댁으로 오라고 하셨다. 좋은 책이나 귀한 물건을 내놓고는 나더러 골라 가지라고 하셨다.
원래 말씀이 적은 분이지만 속마음은 무척이나 다정다감하셨으며 늘 정이 그리우신 분처럼 보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으므로 일가친척이 남한에는 한 분도 없었다. 그러나 한 번도 고향이 이북이라는 말씀이 없으셨고, 사투리도 전혀 안 쓰셨다. 졸업을 며칠 앞두고 선생님들이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다. 그때 백 선생님은 잊히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
“세상은 짧은 것이고 인생은 잠시 이 땅 위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것이나 의리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모교에서 훈장을 하던 중, 현대건설로 직장을 바꿨는데 그때도 나는 백 선생님께만 미리 말씀을 드렸다. 그때가 진학반을 담임하던 때였고, 학기 중간이었는데도 선생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셨다.
선생 노릇을 하는 것보다 월급도 많고 장래성도 있으니 떠나라는 것이었다.
담임했던 반 아이들에게 나는 큰 죄를 짓고 교문을 나서는데, 백 선생님께서 교문 밖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주시면서 시간 있으면 놀러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돈으로 꽤 많은 액수를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일 년에 몇 번씩 전화하고 편지도 올린다. 이제 내가 한국과 가까운 괌으로 왔으니 꼭 한번 모시고 싶다. 팔라우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여드리고 싶다. 밤하늘의 남십자성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