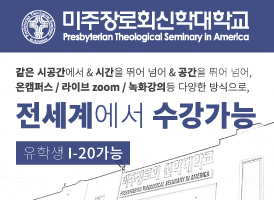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동열모칼럼]山村에서 느낀 가을 정취
요즘 코로나 공포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다가 기분을 전환하고자 친구와 둘이서 느긋하게 야외 나들이했다.
서울의 아파트 숲을 벗어나 황금물결이 남실거리는 가을 들판을 걷노라면 가슴이 탁 트여 세파에 오염된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만이 감도는 천국이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오직 가을 풍광에 도취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호젓한 산자락 오솔길을 따라 경쾌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정겨운 시골 풍경을 즐기면서 걷다 보니 뜻밖에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과 흡사한 시골길에 접어들었다. 길 양옆에는 코스모스가 줄지어 만발해 우리를 환영하듯이 가을바람에 물결친다. 이 코스모스 길은 지닌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흔히 보던 농촌 길을 연상시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다.
이 코스모스 길을 감상하면서 걷고 있는데 옥수수밭이 나타났다. 익어가는 옥수수 이삭에 고추잠자리가 앉아 춤추듯이 한들거리기에 우리 시선을 끌었다. 근년에는 좀처럼 보지 못한 고추잠자리를 오늘 이곳에서 보니 마치 잊었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옥수수밭 옆에는 있는 콩밭에는 익어가는 풋콩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보여 아득한 어린 시절에 콩서리 하던 추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또래들과 함께 야외에서 불을 피워놓고 콩서리 해 놓고서는 욕심을 부려 먹다 보니 얼굴은 온통 검은 숯으로 얼룩져서 서로 흉을 보며 장난치던 개구쟁이 시절이 떠오른다. 콩밭 옆에 있는 수수밭에는 탐스러운 수수 이삭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인 모습이 풍요한 가을 정취를 드높인다.
산자락에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억새풀이 우거져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하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른다. 억새밭 옆에는 가지각색의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어 가을의 정취를 짙게 한다. 그 야생화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들국화가 보이기에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살며시 만져보았다.
가을 바람에 한들거리는 화사한 보라색의 이 들국화는 보면 볼수록 청아(淸雅)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며, 티 없이 맑고 꾸밈새 없이 맑게 보인다. 이 들국화는 장미꽃과 매우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장미꽃은 화려한 작태를 뽐내는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들국화는 소박하면서 수줍어하는 농촌의 아름다움이라고 여겨져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비탈길을 돌아가니 아늑한 동네가 나타났다. 주황색 단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에 둘러싸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자그마한 山村이 바로 내가 저 북녘땅에 두고 온 옛 고향 같아서 무의식중에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나라 전체가 아파트로 덮여 이미 사하진 것으로 아쉬워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아직도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마을의 아늑한 분위기를 자칫 훼손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동네에 들어서니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에는 빨갛게 물든 고추가 널려있고, 그 옆에는 황소가 비스듬히 누어 새김질하는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다. 울타리 밑 자그마한 화단에는 근년에 좀처럼 보지 못하던 봉선화가 보이기에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굴뚝에서는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뒷산 허리를 조용히 감싸고 있다.
모처럼의 이 기회에 山村의 가을 정취를 더 짙게 감상하려고 우리는 호젓한 언덕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고 간식을 먹으면서 시긴 가는 줄도 모르고 낙원과도 같은 이 농촌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고향의 봄>을 입 속으로 불렀다. 비록 계절에는 맞지 않는 노래지만 나는 2절까지 부르면서 내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미움도 없고, 탐욕도 업고, 오직 여유롭고 넉넉한 農心만이 넘치고 있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山村에 황혼이 짙어지자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숙소를 향해 내려왔다. 내 일생에 잊지 못한 山村의 가을 정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