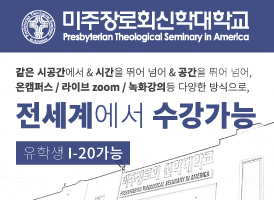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동열모칼럼] 향수를 달래주는 <라디오한국> 이야기
이곳 한국에서 입수한 소식통에 의하면 <라디오한국>의 창설 2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기에 <라디오한국>의 개국 당시에 이민 1세 할머니의 실화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이주한 이민 1세, 특히 할머니들에게 <라디오한국>은 향수를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고 있답니다. 이민 1세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모든 생활방식이 생소한 미국 땅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도 <라디오한국>에서 흘러나오는 고향의 옛 노래나 재미나는 이야기가 눈물겹도록 반갑기만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의 초청으로 막상 이주해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친구도 없었고, 아는 사람은 오직 아들 내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내외가 직장에 나가면 낮에는 하루종일 빈집에 우두거니 앉아 뜬구름을 쳐다보면서 신세타령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밖을 내다보니 가로등이 비를 맞아 빗물이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가로등이 마치 내 모습과도 같아서 나는 혼자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와 나한테 다가와 인사하다가 내 눈시울이 젖은 것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 손을 마주잡고 잠시 생각하더니 문득 일어나 라디오를 들고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라디오를 내 앞에 놓으면서 말하기를 “최근에 <라디오한국>이라는 우리 말 방송국이 생겼습니다”라고 속삭이며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갑자기 우리의 흘러간 옛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뜻밖의 옛 노래에 깜짝 놀라면서 너무도 반가워 그 라디오를 내 앞으로 더 가까이 옮겨놓았습니다. 이 머나먼 낯선 땅에서 우리 말과 우리 노래를 듣다니 너무도 신기해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기뻐하는 시어머니에게 라디오를 내 무릎 앞에 놓으면서 이제 어머니 마음대로 들으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에 나는 라디오를 계속해 들으면서 구세주 같은 이 라디오가 너무도 고마워 살며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라디오는 이제 나와 함께 고락을 함께 할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안도감에서 나는 이제 향수나 고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니 내 일상생활에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구수한 옛 노래와 재미나는 연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차례씩 고국의 뉴스는 물론 이 지방 소식도 전해주고 있으니 이제까지 캄캄하던 외부 소식도 접하게 되어 상록회라는 노인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래의 노인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빙고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는 이 상록회에서 새로운 친구도 생겨 이제 외로움에서 해방되었으니 <라디오한국>이 더욱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며느리에게 자랑하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이 방송국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말에 의하면 <라디오한국>은 서정자라는 여사장이 운영하는데 서정자 사장은 일찍이 이곳 서북미 지역에서 전파 이용권을 취득하고, 1997년 10월 1일에 개국해 우리 Korean Community가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국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말 방송이 있기에 이 낯선 땅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노인들을 살려주었고, 동포사회에도 새로운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상까지 높이고 있답니다.
<라디오한국>은 <KOAM TV 방송국>과 함께 Federal Way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에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