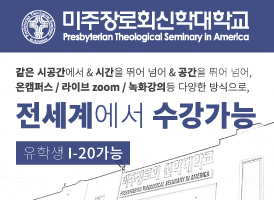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레지나칼럼] "열심히 살아가는게 ‘힘’이다(1)" -시애틀한인커뮤니티칼럼
나는 거의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미국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미국직장에서만 30여 년간을 일하고 있다.
일반직장 일하고는 다르게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단체 등이나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복지혜택 등등 구석구석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등을 일반인들보다는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나의 개인의 성격 탓일까?
내 주머니가 좀 비어있어도 그다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어디를 가면 무엇이 있다는 정보 등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니까.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차는 운전해서 갈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아주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
내게 좋은 유명 브랜드 네임의 비싼 옷이 없어도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내가 뭘 입고 다니든 누가 뭐라고 해도 별 신경을 쓰고 힘들어하지 않는 편이다.
이 바쁜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의 생각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이다.
이곳 시애틀로 올 때에 큰아이가 5학년 둘째 아이가 3학년 막내가 3살이었다. 우리 시어머님은 딸만 넷에 아들을 하나 낳으셨는데 워낙에 딸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해서인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어서인지 내가 셋째 아이를 갖게 되자 나에게 아주 쓴소리를 하셨다.
이미 이쁜 두딸들이 있는데 뭐하러 또 아이를 갖고 그러냐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옛날에는 무지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요즈음 같은 세상에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세상에 무슨 애들을 셋씩이나 낳느냐고?
또 한마디 덧붙이셨다.
세상은 좁고 땅덩어리는 좁아져 가는데 이 땅이 네 땅이냐?
아이를 또 갖게? 라며 나를 나무랐다.
아니, 아이는 내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마치 나를 혼자 아이가진 사람처럼 중죄인 취급을 하시며 나를 나무라셨다.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랴 파트 타임으로 일하랴 늦게 시작한 공부하랴 정신없이 바쁜 나는 워낙에 나를 가꾸는데 소질이 없었고 더구나 치장하고는 거리가 멀었었다.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는 아이구, 여자 손이 그게 뭐냐? 손을 가꾸어야지? 라시면서 빨간 매니큐어라도 칠하고 다니라면서 어느 날은 당신이 쓰시던 빨간 자줏빛 나는 매니큐어를 내게 주셨다.
팔순을 넘기신 시어머님의 손은 항상 윤기가 나고 손가락 끝에는 붉은 장미 빛깔의 장미들이 피어난 것 밝았었다.(혹시라도 부엌일을 하실 때는 고무장갑을 꼭 끼고 일하셨고 밤에 주무실 때는 손등에 바셀린을 푸짐하게 바르시고는 면장갑을 끼시고 주무셨다.)
그 시절에 나이도 어리고 제법 순진하기만 했던 나는 시어머님의 분부대로 자줏빛 나는 매니큐어를 손톱에 바르고는 우아하게 행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워낙에 세 아이 치다꺼리하느라 또 밀린 숙제하랴 온 식구 밥 해먹이랴 자줏빛 매니큐어는 일주일 만에 내동댕이쳐버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적이 없었다.
첫째 매니큐어 바르는 시간이 답답해진다.
둘째 매니큐어 바른 손톱이 무겁게 느껴진다.
셋째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니 손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워낙에 많으니 매니큐어가 손톱에 남아있지를 못한다.
남편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시골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미국의 중북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라고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아니, 한 시간 이상 달려야만 겨우 예전에 한국에 주둔했던 주한미군과 결혼을 했던 분들 서너 분들이 살고 계셨다.
우리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미 중북부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주민은 2000명정도 살고 있었고 근처에 작은 레드 아올(빨간 부엉이)이라는 그로서리 가게 하나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여름에만 오픈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전부였다.
이곳으로 남편이 발령을 받기 전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나는 운 좋게도 집에서 40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곳의 마샬필드라는 유명백화점의 엑서서리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그때에 백화점 매니저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는데 별로 치장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는 내가(생얼굴에 입술만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거의 화장을 하지 못한다.
이쁘게 화장하는 데 자신이 없고 내가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별다른 작품이 나오지를 않으니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반 점원에서 매니저가 된 것은 아마도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중에 나를 매니저로 채용했던 상사에게 나를 왜 매니저로 그 자리에 뽑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레지나를 재미있어해서였단다.
동료들이 재미있게 일하니 모두들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니까 매상도 더 좋아지고 기분 좋은 일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단다.
아마도 나는 약간의 광대 기질이 있는듯하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는 편인데 나하고 며칠간 일을 하다 보면 모두들 너무나 편안히 생각을 하고 재미있어하니까…
그때에는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역시 공부를 하던 때라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없었다.
늘 잠이 부족해서 40분씩 운전을 해가며 직장을 출퇴근하면서 내가 늘 주문처럼 외우던 말은 잠 좀 실컷 잤으면! 이라는 바람이었다.
나의 바람은 커튼을 드리우고 컴컴한 방에서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직장 일 신경을 안 쓰고 하루종일 그냥 내리 잠을 자보았으면 하는 게 소원 중의 소원이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렇게 잠을 자보고 싶어서 주문처럼 외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몸이 늘 불편하고 붓고 늘 머리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 것 같으니 다시 정밀검사를 하자고 해서 얼마 후 나는 우리 가족이 다니던 교회(온 미국 사람들만 교인인) 사람들의 합심 기도를 받으며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며 그 이후로는 내 정신이 아닌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잠에 빠져 지낼 수 있었으니….
물론 아직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을 돌봐주러 먼 한국에서 나를 도와주러 오신 친구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손자들처럼 잘 돌봐주고 계셨기에 몸이 회복될 동안 나의 꿈대로, 소원대로 매일 매일 하루 진종일 잠을 잘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남편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빨간 벽돌집으로 집안에는 바닥이 모두가 대리석으로 되어있었고 방만 9개가 있었다.
뒷마당에는 작은 강물 줄기가 흐르면서 밤에는 비버들이 나무를 입으로 깎아내어서(비버들은 앞이빨들이 강해서 큰나무들을 15분 정도면 갉아서 쓰러트린다) 무너트리는 소리에 쿵쿵거리고 낯에는 강줄기에서 서식하는 수달들이 물에서 유유히 놀면서 은빛 나는 물고기들을 잡아서는 공중으로 던지며 장난을 치면서 잡아 먹고는 하는 풍경이었고 집 앞마당에서 100m만 걸어가면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이었는데 집이 얼마나 길고 큰지 우리 아이들은 겨울이면 자전거를 집안으로 들여놓고 자전거를 집안에서 타고 다니며 놀았는데 이 집은 우리가 살던 그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집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사시던 돈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기증하셨던 집을 우리가 4년간 살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