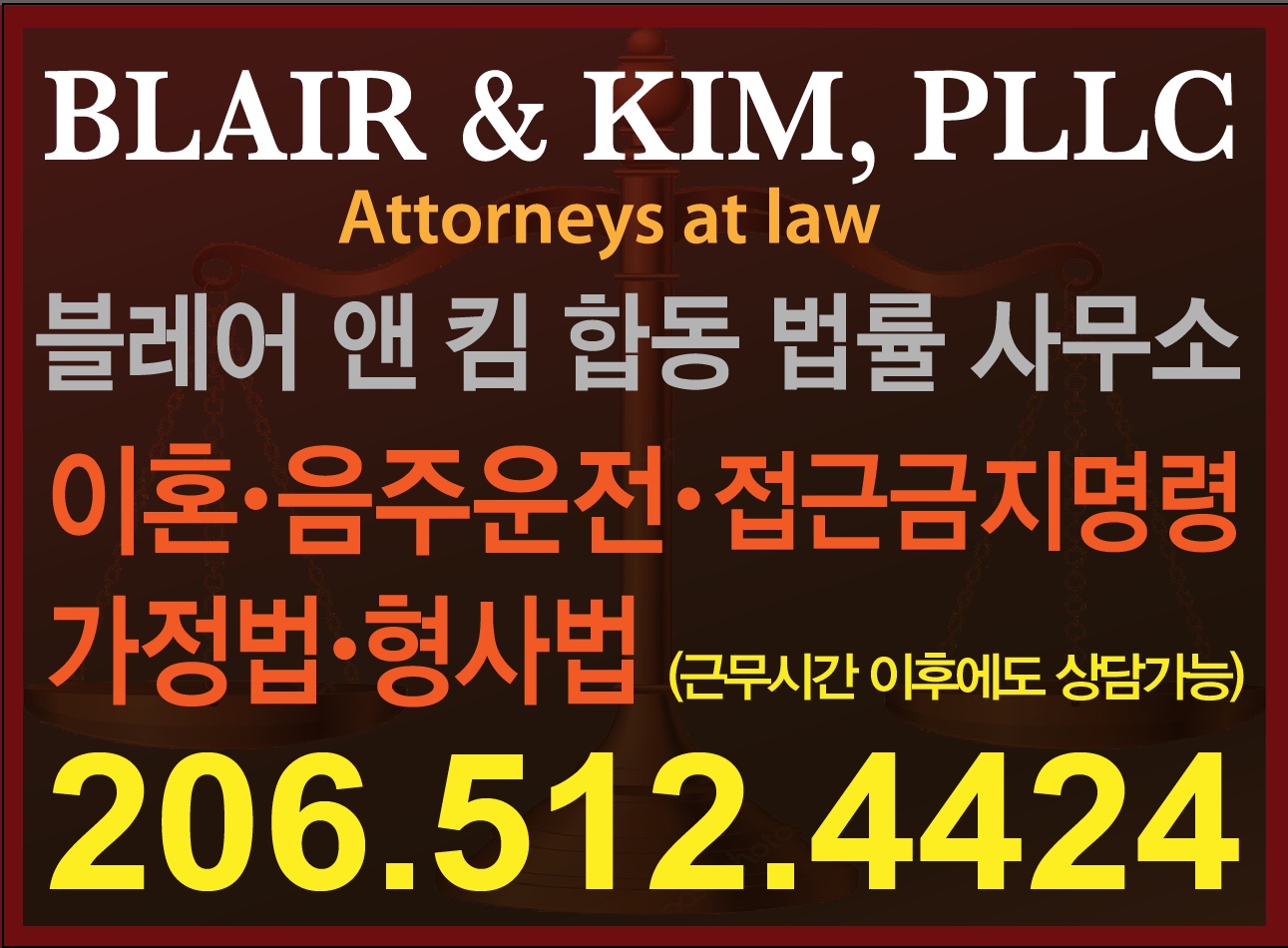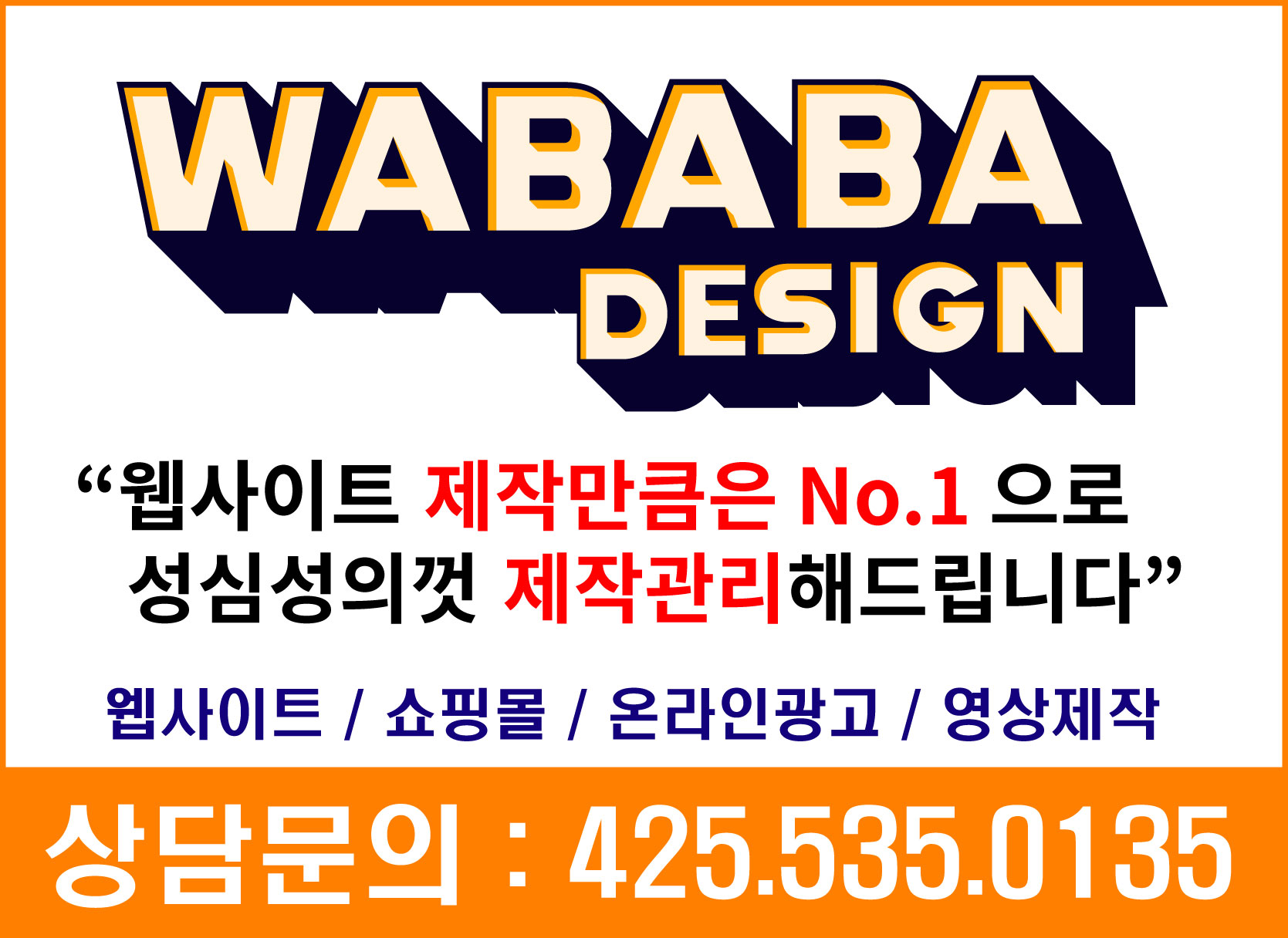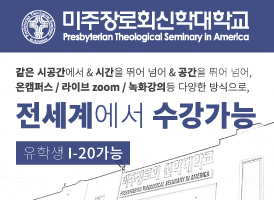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안상목 회계칼럼] 666. 교환가치와 공산주의 4 - 시애틀 한인 회계 칼럼
지난 주의 애플 앱 이야기를 노동가치와 잉여가치에 맞추어 약간 다른 말로 재정리해 본다. 가령 앱 개발업자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500시간 일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 시간당 50불씩 총 25,000불을 지불했다 하자. 그것을 애플 사이트에 올려놓고 한번 다운로드에 애플로부터 2불을 받는다 하자. 그것이 10,000번 다운로드 되어 팔릴 경우와 20,000번 다운로드되어 팔릴 경우와 50,000번 다운로드되어 팔릴 경우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세로줄 B의 단가는 개발업자와 애플 사이의 거래가격이며, 애플은 여기에 마진을 보태서 다운로드 하나당 예를 들어 3불씩 최종소비자로부터 받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표를 작성하여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교환가치와 잉여가치를 검토한다.
표의 세로줄 E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계산된 앱 한 개의 가치이며, 그 가치는 판매(다운로드)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노동가치설이란,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창출된다는 이론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1권 제1장에서 ‘가치’는 아래와 같이 명백히 정의되어 있다.
that which determines the magnitude of the value of any article is the amount of labour socially necessary, or the labour time socially necessary for its production. 무슨 품목이든 그것의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 즉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칼럼 664호(교환가치와 공산주의 2)에서 현대어로 번역된 표준원가의 한 요소, 즉 표준시간이다. 저 표현 속에 시간당 임금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금액이 없는 가치는 없으므로 당연히 그 속에는 표준임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시간에 표준임금을 곱하면 인건비 표준원가가 된다.
위 표는 지난 주 칼럼(665호)의 표를 변경한 것이며, 그 주목적은 그렇게 계산된 세로줄 E가 말이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것을 세로줄 B와 비교하는 데 있다. 세로줄 B는 애플사(社)의 입장에서 본 앱 다운로드 한 건의 가치다. 애플은 이 앱을 개발업자로부터 사서 최종 소비자(다운로드하는 사람)에게 판다. 칼럼 659호(생산자이득과 공산주의 1)에 본 바, 이 비용은 애플의 불변자본, 즉 수량이 변해도 단가는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이제 마르크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세로줄 B의 불변자본 이론이 세로줄 E의 노동가치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불변자본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은 연필 두 자루의 가치가 연필 한 자루 가치의 두 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의 입장에서 앱 다운로드 2건의 가치는 앱 다운로드 1번의 가치의 두배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애플사는 앱 다운로드 수효에 정확히 비례하는 수입을 얻기 때문에, 저러한 틀 속에서는 세로줄 B에 나타나는 가치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앱 다운로드 한건의 가치에 대하여 세로줄 B는 말이 되고, 세로줄 E는 말이 되지 않는다.
노동가치설을 비판에서 애플 앱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것은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생산물이든지 모든 비용 중 개발 인건비만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면 위와 같은 표에 귀결된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개발 인건비는 존재했다. 지난 주에 본 바, 책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간 작가의 시간도 개발비다. 농토를 일구기까지의 노동시간도 개발비다. 미개척지의 돌과 기존 식물을 모두 없애고 농토를 일구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농토가 만들어지고 나면, 개간의 노력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개간 노력까지 감안헤서 계산하면 농산물의 (노동가치설에 의거한) 가치는 농산물이 생산될 때마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농토를 개간하는 그 노력만을 따로 떼어내서 계산하면 위의 표를 닮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신형 자동차의 개발비도 여기에 적용된다. 현실에서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은 항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르크스의 요지는 “모든 잉여가치는 착취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을 위 표에 대입하면, 세로줄 C의 총액이 모두 프로그래머의 소득이 되어야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 모델에서 잉여가치가 (마아너스로든 플러스로든) 나타나는 원인은 개발업자의 기획에 달려 있다. 프로그래머가 한 일은 개발업자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뿐이다. 저기서 나타나는 잉여가치가 모두 프로그래머의 노력 때문이라 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노력 없이도 저러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이나 같다.
개발업자의 노력을 따로 노동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 경우 개발업자의 역할은 통상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잡는 것뿐이다. 노동의 양을 계산할 수 없다.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며, 축적된 그 능력을 인간자본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면, 저 모델의 경우 잉여가치는 인간자본에서 창출된 가치다. 마르크스 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인간자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