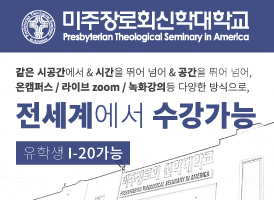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정병국칼럼] “처음처럼”
2007년 가을쯤에 금강산 여행을 했다. 그 당시 괌에서 살 때였는데 내가 평통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방문 기간 중에 금강산을 여행하는 스케줄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금강산을 구경했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과연 금강산이 일만 이천봉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뾰족하고 기이한 봉우리들이 마치 조각가가 다듬어 만들어 놓은 듯이 아주 멋있고 예술적으로 생겼다. 일류 조각가 수십 년을 두고 다듬어도 그렇게 정교하고 멋있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감탄스럽고 경이로웠다.
금강산을 오르려면 수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죽한 수건을 하나 샀다. 북한에서 만든 것인지 몰라도 그냥 밋밋한 수건이었다. 그런데 그 수건에 새겨진 낱말이 “처음처럼”이었다.
처음처럼이란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처음처럼 마음이 변함없이 살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과 성의를 끝까지 가지고 일을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과 성의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늘어나고 하는 일의 성과가 눈에 보이기 사작하면 처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엔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이나 끝에 가서는 시시하게 끝내버린다. 인간 중 더러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집어치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다. 결심하고 일을 시작한지 3일 후에 흐지부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하다하다.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버릇이고 습관이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첫 날에 대단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일기장에도 적어놓고 달력에도 표시를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목표가 정월 한 달도 채 못 가서 흐지부지 사라진다.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것도 처음 며칠은 아주 길게 잘 쓰다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가 며칠을 건너뛰기도 한다. 그다음엔 일기장을 잡기장 정도로 둔갑시키고 낙서장으로 전환하다가 그것마저 없어지고 일기장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일기장을 내가 사장(죽여서 파묻음)시킨 것이다.
요즘엔 스마트 폰이 생겨서 아예 일기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몇 달 쓰다가 그만둔 일기장이 지금도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다. 어쩌다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나는 일류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한 사람인데 일기장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만뒀으니 무슨 글을 쓰겠는가? 이런 정초의 계획과 실천의 실패는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정초에 가졌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또 며칠 간 일기를 쓰다가 또 집어치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 나오는 일기장엔 날짜를 넣지 않고 그냥 공백으로 노트북처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 달을 보내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른다.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커가고 성공한다.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혜로워지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사람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알찬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비록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참으로 장한 일이고 인간적인 삶이다. 사람이 너무 정확하면 숨이 막히고 매력이 없다.
인간은 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더욱 인간적이고 친구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처럼 올곧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면 재미도 없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고 둘이서 함께 기대어 사는 것이다.
한자로 사람 인자(서로 기댄 모양)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왔다가 갈 때는 두 손을 짝 펴고 간다. 이 세상에 허다한 어느 영웅호걸을 막론하고 주먹을 쥐고 가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오래전에 85세로 세상을 떠난 구상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칼럼을 마무리한다.
“나는 죽고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 재산을 장애인 문학지(솟대문학)에 기부했다. 인간은 처음 세상에 티 없이 올 때의 <처음처럼>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