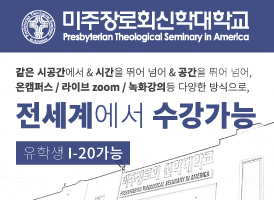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리사운드교회] 가을에 생각되는 인생의 정의
인생이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가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애틀의 여름철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먼 옛날이야기 같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할 수 없는 홀로 됨이란 말이 주변에 많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이란 아무리 익숙 하려 애써도 동화될 수 없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85세 된 노모의 음성이 들립니다.
문 열고 들어오던 그 남편의 모습이 이제는 꿈에도 볼 수 없기에 더 외롭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느덧’이라고 표현하는 그 ‘덧’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러함을 덧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그 지혜로움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덧'이란 순간이나 찰나의 다른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덧’이란 놀랄 때 쓰는 '엇'과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덧' 은 영생에 비교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덧있다 덧없다’의 의미도 그리 대수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일들이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에 마치 생명을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무시 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기회에 배려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실천한 수많은 이들의 내부가 파헤쳐졌을 때 어이없게 실망을 하게 됨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말한 헛되도다고 한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러한 전제 가운데는 세속적 삶이란 범주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덧없다 함은 반드시 세속의 시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관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관적 설계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 방도라는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위가 쓰린 아픔을 겪어 보면서 도저히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 쓰림이 나의 정신을 그곳에 집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던 잔디 깎는 일조차도 마치 힘겨운 중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위 쓰림만 없으면 모든 것을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을 쉽게 체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질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란 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질없는 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매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지혜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혜일 수밖에 없으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덧없음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고 말한다면 무리이겠습니까.
우리가 허무하다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실상과 허상은 철학 수업 시간에만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씀이 떠 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실상도 믿음이 없으면 허상이 된다는 말과도 같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덧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너무 좋아서 2번 도로를 달려서 미루었던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옛적 한때 경험하였던 그 양탄자 같은 단풍은 아니었지만, 웬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돌아오면서 Deception Falls를 들러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잡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곡의 물소리에서 중학생 때 읽었던 헤르만에서의 싯다르타에 나오는 그 완성의 소리 "옴"이란 단어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옴"이란 "덧"과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덧’은 찰나이지만 ‘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덧’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 완성된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불태워져 버리지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게 됨입니다.
그 ‘덧’조차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의미가 우주보다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덧’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의 실상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을 사는 자들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