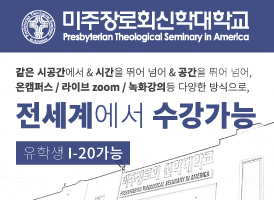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서유석칼럼] 단풍이 진 후에 가을을 후회한다
수필-서유석
단풍이 진 후에 가을을 후회한다
<못>
당신이 내 안에 못 하나 박고 간 뒤
오랫동안 그 못 뺄 수 없었습니다
덧나는 상처가 두려워 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당신이 남겨 놓이 않았기에
말 없는 못 하나도 소중해서 입니다
<김재진>
시애틀의 가을 단풍은 유난히 붉은색이 인상적이다.
가을비가 추적 추적 내리면 집 앞 인도에 떨어진 단풍잎을 쓸어 버리기가 어렵다.
몇 해 전 비 오는 어느 가을날 LA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전화 속 저 멀리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리 밝지 않은 중년 여인이었다.
혹시 <김XX>라는 분을 아시지요? 한다. 네? 갑자기 모르는 여인의 묻는 말에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김XX>라는 분이라면, 몇 해 전에 이곳 시애틀에 사시다 LA로 가신 분을 말씀하시나요? 전화 속의 목소리는 내가 그분을 알아보니 반갑다는 듯이 네~~ 그 분이에요… 하신다.그분이라면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분이지요…
<김XX>라는 분은 이곳 시애틀에서 사시다가 LA로 내려가신 분이다. 전화를 건 그 여인은 제가 그 분의 부인인데요. 하신다 지난 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네?? 내가 깜짝 놀라며 아니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왜 돌아가셨나요?
나는 더욱 놀란 것은 그 분에게 부인이 있다는 말을 그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더욱이 부인이란 말에 놀랐다. 그는 가끔 만나서 골프를 치는 관계였는데 본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셔서 일체 묻지는 않았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LA에 아들과 딸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셨다. 본인이 이야기 하기 전엔 무엇이나 일체 묻지를 않은 나의 습관 탓이다. 그래서 부인과는 사별이나 이혼하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었다. 그 부인의 이야긴 그간 LA로 남편이 내려오신 근 1년 후부터 실음 실음 아프시다가 <암>이 발견되어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주면서 본인이 죽으면 장래를 치른 후에 나에게 자기의 사망 소식을 알려 주고 꼭 나에게서 <선물>받은 골프채를 잘 치고 갔다고 전해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까짓 골프채 한 세트도 아니고 <드리이브> 하나를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드린 것인데 그게 고맙다고 돌아가신 후에 전화까지 하라고 하셨다니 나는 속으로 민망스럽고 부끄러움과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도 먼 곳에 있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 어야 할 정도의 그것이 그 분에겐 보물이었을까? 그리고 <선물>이라는 표현도 나에겐 부담스런 표현이다. 엄연히 팔고 산 물건이다.
한번은 그분과 라운딩을 하는데 1번 홀에서 내 드라이브로 한번 처 보자고 하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엄청 롱샷이 나왔으며 모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나이스 샷이 터진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끝난 후에 그 <드라이브> 나에게 팔지? 하신다. 그래서 그 분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분이라면 팔고 싶진 않았다. 그냥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골프채는 그냥 받으면 골프가 잘 안 맞는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단돈 $100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분이 우겨서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징크스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돈을 안 받을 것 같으니 꾸며낸 말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소 성품을 짐작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이분에게 드린 <드라이브>는 나에겐 애물단지와 같았다. 내 실력으론 조금만 힘을 주고 멀리 좀 날려보겠다고 치면 꼭 어김없이 <오비>가 아니면 정글 속으로 공이 들어가는 습성이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그분이 치면 롱 샷에 정확한 비거리가 난다. 그분은 내 <드리이브>를 받고 부터는 싱글 벙글하며 행복해 하셨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다. 이 <드리이브>가 요즘 돈을 잘 벌어주고 있어! 아주 보물이야 하셨다. 돈 내기에서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어…. 하셨다
이분과는 식사 약속을 하면 늘 먼저 와서 내가 오기 전에 <밥값>을 먼저 카운터에 내놓고 계셨다.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만나도 대부분 먼저 주문하고 커피와 빵을 받아 놓고 계신다.
이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통이 커서도 아니다, 사람 앞에서 생색을 내려는 것도 아니다. 평소에 늘 너그럽고 여유스런 성품이신 것 같다. 나도 이분과 약속이 되면 먼저 도착하는 습관이 생겼다.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사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 분은 만나면 인생의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 본인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니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은데 순간 순간 마치 도인이나 종교에 심취하신 분의 말씀과 같이 여운을 남기신다. 이 분이 책을 참 많이 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분이 나는 늘 내 곁에 언제까지도 계실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에 그분으로부터 시애틀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밥값을 잘 내시는 분이라 서가 아니다. 배포가 크신 분이라서도 아니다. 이런 품성의 마음을 나도 배우고 싶었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 분의 친구분을 그분이 시애틀을 떠나신 후에 함께 식사를 한적 있다, 친구분 말씀이 LA에서 운영하던 사업체가 화재로 전소가 되어서 이곳 시애틀의 자기한데 와서 계셨다며 그간 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LA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여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분의 내력을 들려 주셨다.
이분이 LA에서 계실 때 두 개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밤에 운영이 잘되던 식당 한 개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보험 만기가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화를 당하였던 것이다. 나머지 식당을 처분해도 피해 보상이 모자라 집도 팔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그 부인의 전화를 받은 후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차 속에서 한참을 울게 되었다. 왜 우는지도 모른다. 통곡을 하고 싶어지도록 눈물이 난다.
그동안은 그분이 LA 어딘가엔 살아 계셨다는데 위안이 되었던 것인가?
나는 얼마 후에 골프채를 원하는 분에게 모두 주게 되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연필 탓을 한다고 나는 드라이브가 안 되면 드라이브를 샀고 3번이 안 되면 3번을 사고 빠따가 안되면 빠따를 샀다. 이럭 저럭 모은 것이 고급 골프채 세트가 된 것이다. 골프와 이별을 하고 난 후엔 왠지 마음이 편해졌고 그분의 기억도 그 부인의 전화 목소리도 모두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간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다.
이별의 종류가 많겠지만 죽음으로의 이별이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이 아닌가?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오는 단풍인데 왠지 오늘은 단풍잎을 밟으며 지나간다. 가을이 지나가는 것을 이번엔 꼭 잡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를 만나 본다. 지우지 않은 카톡엔 그 분의 화사하게 웃는 모습과 <언제 몸 풀러 가시지 않겠어요?>라는 라우팅하자는 그의 <초대장>이 있다. 이제 나도 <카톡>의 초대장에 응답할 반가운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