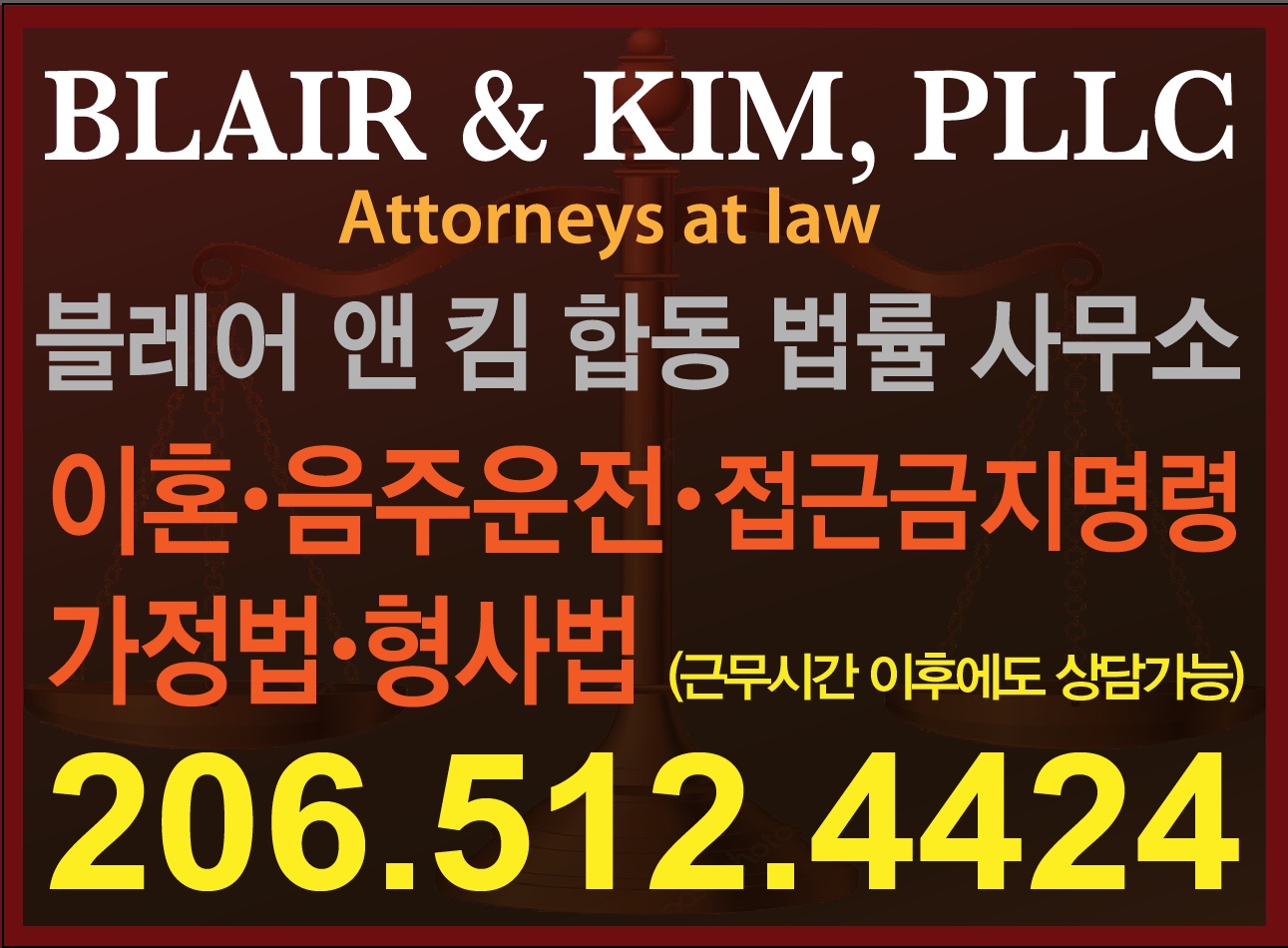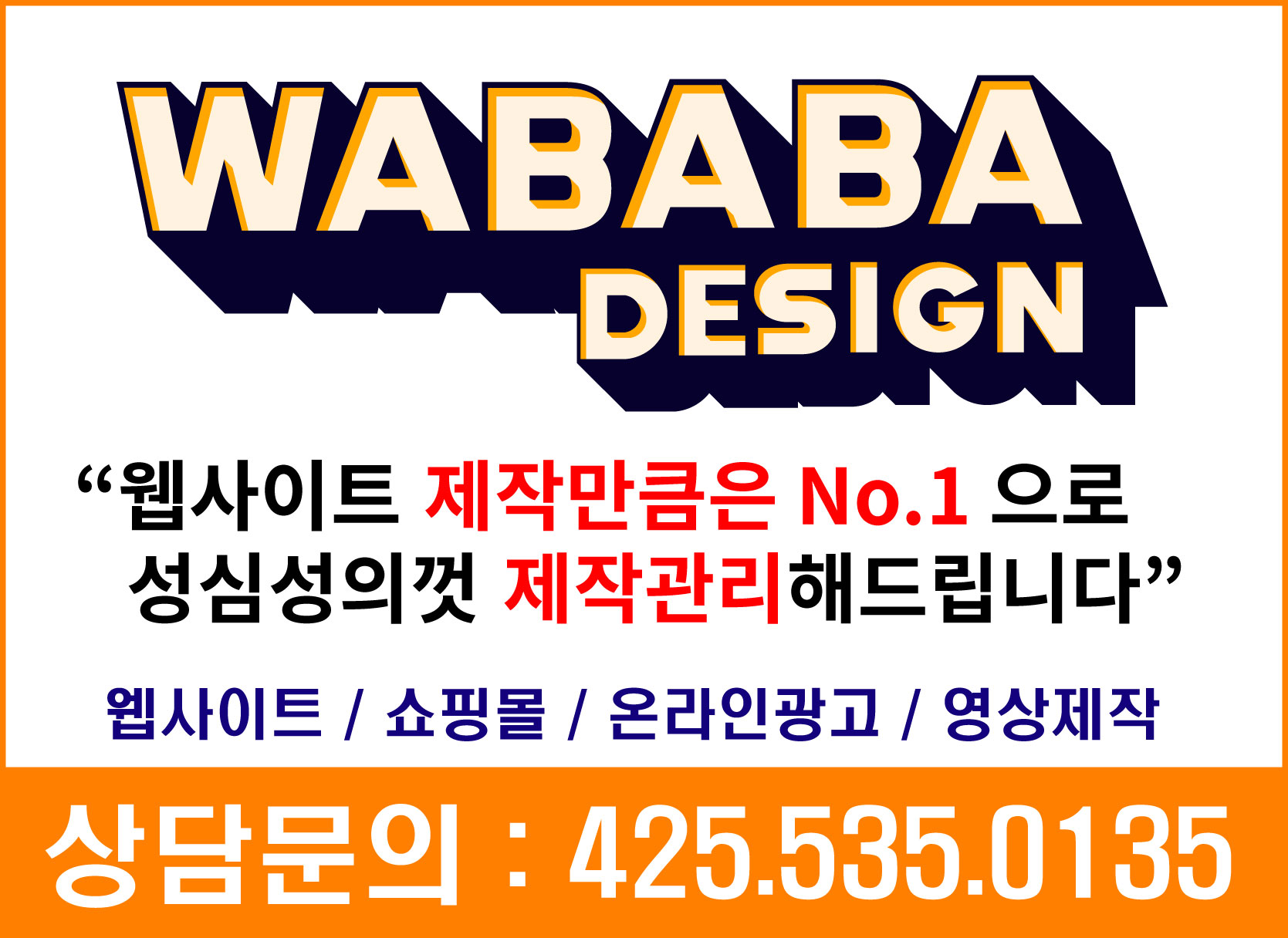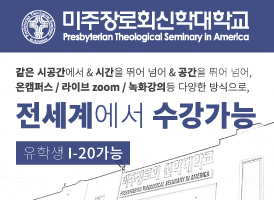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엘리엇 김의 감성과 지성] 정치 이야기
정치란 무엇일까요?
부정부패, 권력 쟁취를 위한 권모술수, 의회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세상의 이야기 등등...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적이 거나 낯선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러한 우리들의 편견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중을 이끄는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강의실의 실내 에어컨 온도는 몇도로 설정해야 할지, 부모님이 정한 통금 시간을 지킬지 말지,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우리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는 모든 인간집단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노동자의 연봉은 3만 불로, 정치사회학의 학점은 B+로 학생의 통금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정치적 과정에 반드시 개입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 Power’입니다. 모든 정치 현상에는 반드시 권력이 작용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학창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께 항상 밤 10시 전까지는 반드시 집에 들어오도록 제약을 강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10시라고 정해진 통금 시간이 바로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치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물이 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이 합의를 쉽게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한 권력의 작용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제공하는 집과 용돈, 안전들은 여러분에 대해 부모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 냅니다. 부모님은 이 같은 권력을 통해 여러분을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오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10시 통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못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단 내 일부가 권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공동결정을 이끌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같은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던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저서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으로 유명한 막스 베버, Max Weber는 ‘정치는 권력의 장악과 배분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화폐인 것처럼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권력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단순히 권력의 작용만으로 설명 될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화폐가 가지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의 권력은 말 그대로 ‘수단’에 불과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puzzle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 Choice’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튼(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는 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스튼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권력보다는 배분에 더욱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배분’이란 쉽게 말해서 ‘의사 결정과정 이후에 내려진 선택’을 의미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통금시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10시통금 이라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의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권력’ 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9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굳이 10시라는 결과물을 봄으로써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치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의 결과가 10시 통금이 아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면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 권력이 그만큼 변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나 12시 혹은 통금 해제와 같이 선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여러분께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알바를 하면서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때, 부모님 없이도 자립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저항이 부모님을 완전히 포기시켰을 때 등으로 말입니다. 권력과 더불어 선택의 개념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기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수백 년에 걸친 정치대립을 연구하려 할 때 권력의 개념에만 집중한다면, 노동착취 임금체불 노조형성 파업 등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고통스러운 작업이겠지요. 하지만 선택이라는 숲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끊임없는 정치대립은 ‘주5일제’라는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주5일제라는 숲은 노동착취 임금체불 노조형성 파업 같은 개별적인 나무들을 바라볼 때보다 정치 현상을 이해 하는데 있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5일제는 노동자의 복지를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본가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제도가 될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자본가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정책들을 만들자하는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시처럼 정치란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가는 권력작용만이 아니라 이후 내려지는 선택까지가 정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권력과 선택의 개념 모두를 인지하며 정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정치 현상의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통찰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학을 ‘불확실의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학은 경험의 분석일 수도, 사후적 해석 일수도, 현상의 대처와 분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의 choice이기에, 역사는 accicent가 아니기에 예측이 현실로 들어맞지 않는다 하여 학문적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치학이 아무리 탁상공론 같이 보이고 제대로 된 정답 하나 내놓고 있지 못하는 학문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결코 이 학문을 등한 시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통찰 하고자 함’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온 인간이 이 같은 실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더 나은 선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 점심 메뉴나 통금 시간 같은 작은 집단의 문제에서부터 법과 제도, 정치체제, 이념 등 국가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사회화입니다.
우리는 정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정치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악한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The price good men pay for indifference to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 - Plato)“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