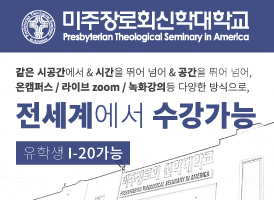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레지나칼럼] “우리 집 천장의 손님” 개똥지빠귀(로빈) (2)
<지난 호에 이어>
밤에는 새들이 자라면서 더 시끄러웠지만 며칠만 더 참자 하고 기다렸다가 페스트 컨트롤 회사 말대로 정확히 2주가 되는 날, 이분들이 다시 천정을 들어가 보더니 새들이 다 날아갔단다.
지난번 떨어진 새는 아직도 무궁화나무에 매달아 놓은 새집에 있는 듯한데...
우리 집 천정은 몇 시간에 걸쳐 온 집 안의 환기통을 막는 공사가 시작되고, 어미 새와 아비 새도 공사하는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공사를 마친 저녁 4시쯤 되자 우리 집 지붕에는 어미 새와 아비 새인 듯한 새가 지붕을 맴돌며 새집이 있던 그물망을 자꾸만 맴돌고는 했다.
저녁 늦게 왠지 가냘프게 들리는 새끼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모든 주위를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이니, 천정에서 나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가냘프게 들리는 새소리들이 있었다.
한 마리 같지는 않고 두 마리인 것 같았다. 아니, 그럼 오늘 아침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에 환기통 공사가 끝났는데, 그럼 새끼들이 아직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조용히 귀 기울이니 아기 새 소리였다.
나는 새들의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서, 아직 캄캄한 밤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 무조건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 전화를 했다. “아니, 천정에 들어가서 새들이 없는 것 확인하고 환기통을 막아야 되는데, 아직 새가 있는 듯하다니까?”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지금 다시 가게 되면 출장비를 또 다시 달라.” “얼마나 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니 너무나 기가 막혔다.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한 것은 새들을 다 날려보낸 후에 환기통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네가 확인할 때는 새가 없었단다.
“아니, 그럼 없던 새가 어디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하고 물어보니 별 대답은 못하고 출장비를 더 달란다. “나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서 어떻게 돈만 더 청구하냐”고 하니까
“그럼 새 한두 마리 그냥 냅둬라.”
그리고는 “그까짓 새 한두 마리 그냥 놓아두면 죽어버릴 테니 그냥 놓아두라나, 그러면 말라버린다나!”
나는 전화통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야! 네 자식이 벽 안에 갇혀 있어도 그럴 거니?”라고.
이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동원되어 환기 철망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새집이 있던 자리 쪽만 쇠로 된 철망을 걷어내기로 하고, 모든 식구가 나와서 한 사람은 사다리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사다리를 붙잡고, 그리고는 완전 봉쇄해버린 철망 쇠그물을 떼어내고 나서 사다리에서 내려온 지 한참을 지난 후에 어미 새인 듯한 새가 다시 제 집으로 들어가는 듯하더니, 새끼들의 짹짹거리며 반갑다고 행복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새끼들은 우리가 쇠 그물 공사하는 동안 천정 어딘가에 숨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생이별을 당할 뻔한 듯하였다. 우리 집 무궁화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만들어준 새집에도 천정에서 떨어졌던 새 한 마리가 어미 새와 아비 새의 도움으로 잘 자라고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다.
그때 금붕어를 몇 마리 사다 주며 아이들이 길렀는데, 얼마 후 금붕어들이 배를 천정으로 내놓고 죽어 있었다. 아이들과 나는 조그마한 성냥갑만 한 종이 박스 안에 죽은 물고기들을 넣고, 우리 집 뒤에 있던 큰 나무 밑을 파서는 금붕어들을 묻어주고, 팝시클 스틱으로 십자가까지 세워주고 기도도 함께 해주었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끔 그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우리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위스콘신의 깊숙한, 백인들만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았었다. 주로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우리 가족이 유일한 동양 사람들이었다.
우리 아이들과 내가 마켓을 가면, 우리 뒤를 마켓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녔었다.
마치 신기하다는 듯이...
그때 우리 집은 방이 9개나 되는 저택이었는데, 단층집에 방이 9개나 있으며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아이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밖에서 놀지 못하니까, 집 안 끝에서 끝으로 세발자전거를 타고서는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게 놀고는 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우리들의 키만큼 쌓이는 그곳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저녁 으스름할 때면 파슘이나 너구리 또는 스컹크 등이 떼를 지어 다니고, 우리 집 앞마당엔 사슴들이 내려와 집 마당에 서 자라는 크랜베리나 작은 사과 등을 따 먹고는 했었다.
파슘은 새끼를 낳아서는 자기 등 위에 새끼들을 업고 다니며 우리 집 뒷마당을 가로지르고는 하였는데, 파슘이 걸음걸이가 느려서 새끼들을 등에 업고 어기적어기적 걷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었다.
우리는 특별히 자주 보이는 파슘을 ‘헨리’라 부르며 “하이, 헨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밤이면 뒷마당 끝으로 흐르는 작은 크릭(시냇물가)에는 비버들이 커다란 나무들을 이로 갉아서 첨벙첨벙 나무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보면 비버들이 막아놓은 댐들이 볼만했었다. 크릭에는 아침나절엔 수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수영하면서 은빛 나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이리저리 토스하며 장난치던 모습도 아름다운 기억이다. 언젠가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너구리를 잡아서 보여준다며 너구리 덫을 설치했는데, 그 너구리 덫에는 원치 않던 스컹크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스컹크는 냄새를 발사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스컹크가 들어 있던 덫을 긴 빗자루로 문고리를 올려서 달아나게 할 심산으로 빗자루 긴 것을 들어 문을 열어주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놀란 스컹크가 방귀를 발사하여서, 직통으로 맞은 세 사람은 숨도 못 쉴 정도고, 분사한 내용물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다가 동네 미국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니, 무조건 토마토 주스에 목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 토마토 주스 한 병이라면 모를까? 어디서 목욕할 만큼 토마토 주스를 구하지?
여기저기 집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캔 토마토 주스 37병을 욕조에 쏟아붓고는 두 아이들과 남편이 들어가, 모두들 벌겋게 되어서 뒹굴며 웃어대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로 스컹크가 발사한 내용물에 노출된 벗어놓은 옷들 때문에 우리 집 안은 스컹크 냄새로 거의 두 달간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나는 그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완전 백인 촌이고 한국 그로서리는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 배추김치를 (우리에게 김치는 김치가 아니고 ‘금치’였는데) 커다란 솥에 두 번을 끓여서 9개의 방과 거실, 차고까지 김치찌개를 한 대접씩 갖다 놓으며 스컹크 냄새가 없어지기를 고대하였는데, 스컹크 냄새가 어찌나 스트롱한지 김치찌개보다 더 강한 냄새가 스컹크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
지나간 세월이 이만큼 흘러왔어도 지금도 기억이 되며,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은 자연과의 시간들이었다.
오늘 우리 집 천정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한 듯한 행복한 새 가족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고 있다.
이들이 지저귀며 “짹짹짹” 소리가 가슴을 뭉클거리게 한다.
가족 상봉인 시간일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