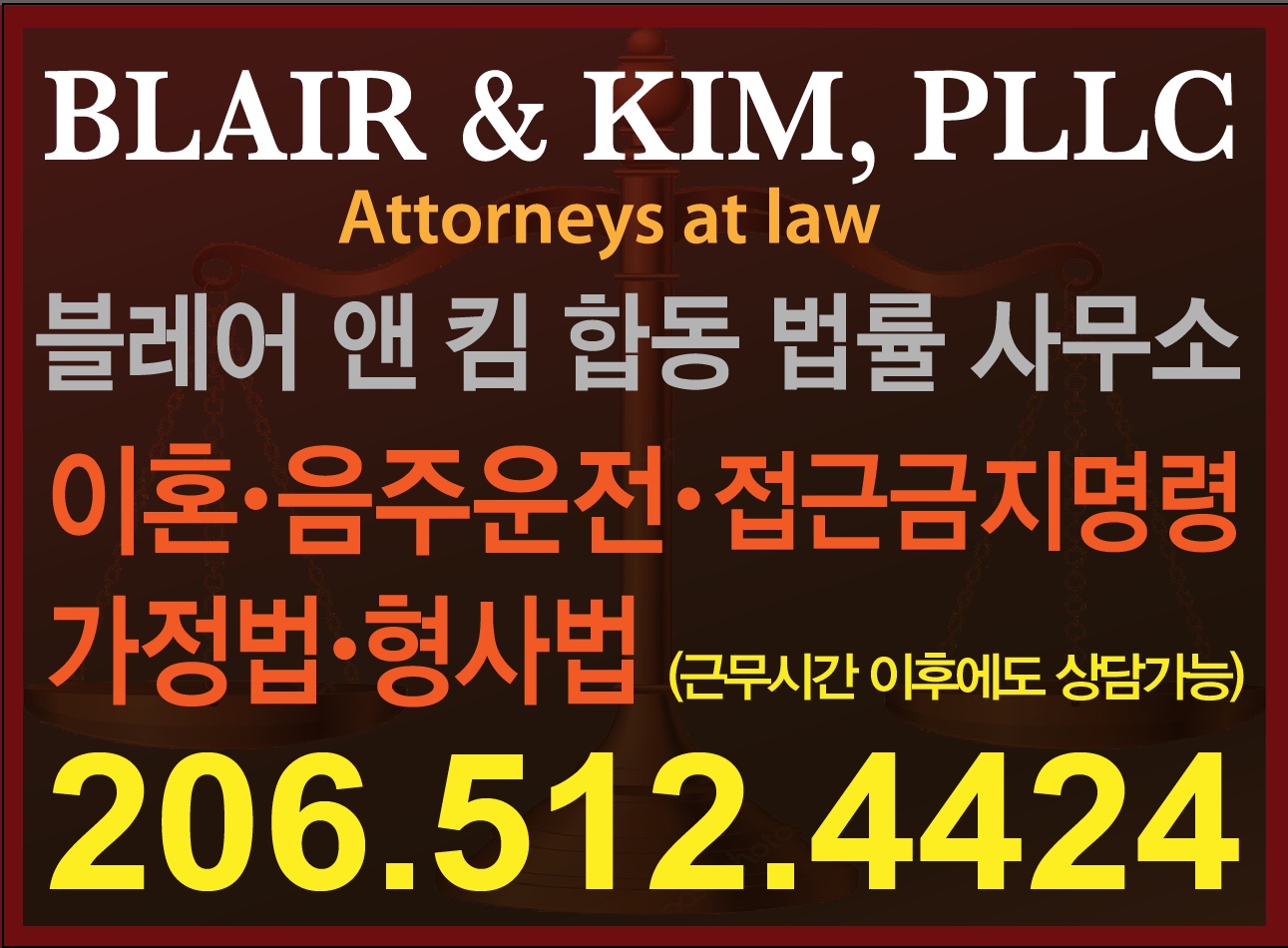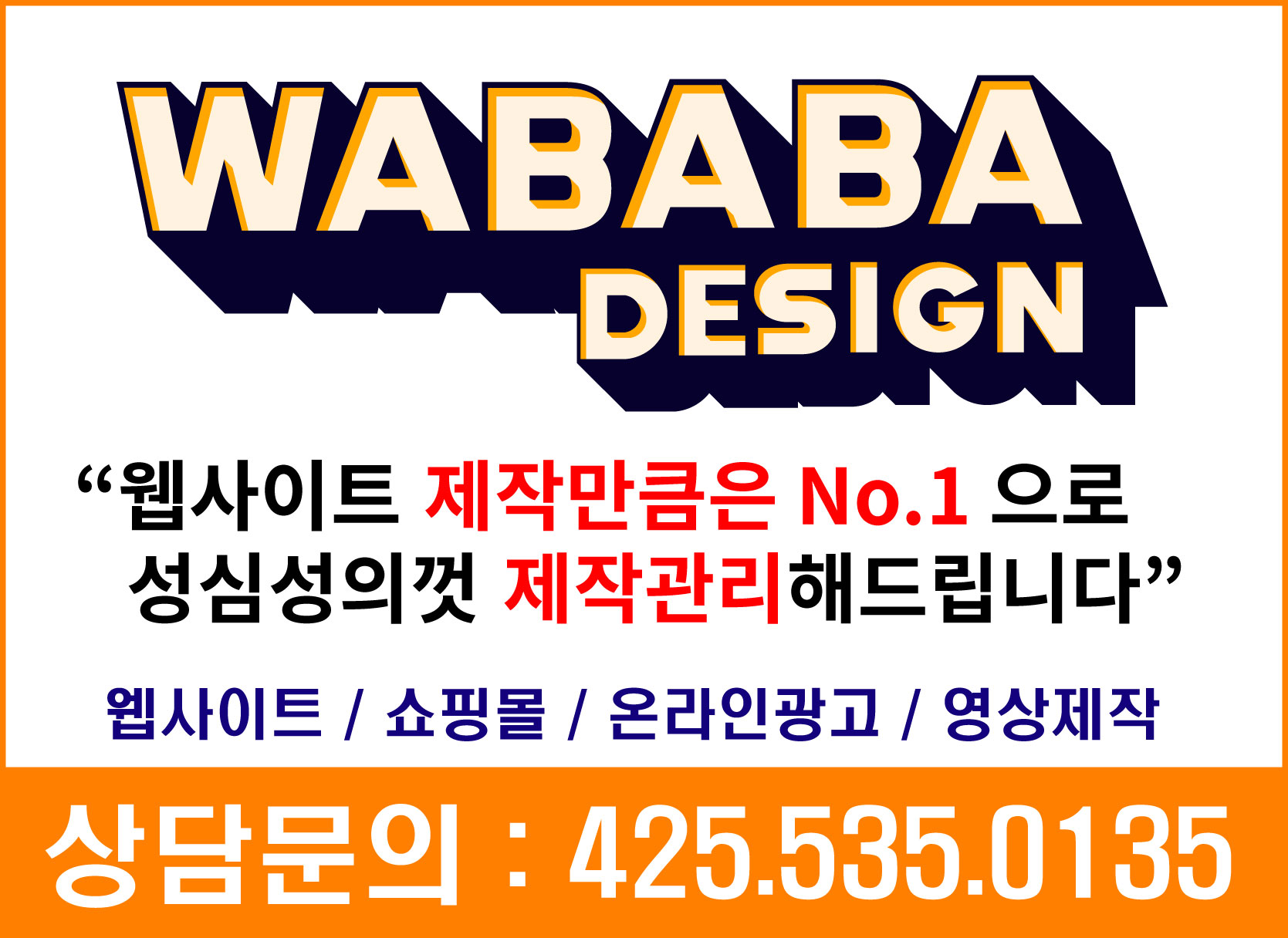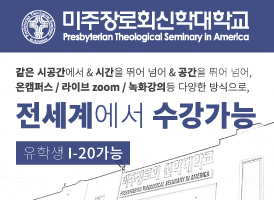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안상목 회계칼럼] 669. 빅토르 위고와 마르크스 - 시애틀한인 회계칼럼
빅토르 위고(1802-1885)는 사회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보수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의 생각은 2012년의 영화 레미제라블에 잘 나타나 있다. 마르크스(1818-1883)와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문제를 인식했으나, 해결의 방안은 달랐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1815년부터 1848년까지 계속된 프랑스의 왕정복고 시대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1815년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고, 1789년 혁명의 정신은 그 때부터 다시 억눌러졌다. 그 영화에 나오는 민중 봉기는 1932년 6월의 일이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프랑스는 1789년부터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혁명세력이 만든 제1공화국의 군관이었다가 나중에 혁명세력의 황제가 되었다. 나폴레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황제냐 대통령이냐 하는 지위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었다. 평등은 자유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이 칼럼에서는 지금부터 그냥 평등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나폴레옹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욕을 먹지만, 나폴레옹을 통하여 프랑스 혁명의 평등 정신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것도 사실이다. 나폴레옹 법전이 아직도 존중받는 것은, 그 속의 평등 정신을 이후 여러 국가의 입법에서 배워갔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승전국 연합은 평등 정신을 뒤엎어버렸다. 영화 레미제라블 이야기는 이때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33년 동안 부글부글 끓던 민중의 분노가 1848년에 일제히 터졌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민중 봉기는 유럽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프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정치 노선의 수정이 일어났고,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종식되고 제2공화국이 형성되었다.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빅토르 위고는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나중에는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고 자신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이던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운명을 반복하든, 1851년에 정변을 일으켜 이듬해에 황제에 즉위했다. 위고의 부친은 나폴레옹 휘하 2천여 명 장군들 중 하나였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도 황제가 된 후에도 나폴레옹을 추종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는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과는 같이 일할 수 있어도 황제 루이 나폴레옹과는 같이 일할 수 없었다.
위고는 축출당하고 은거하여 집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1862년에 레미제라블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으로부터 14년 후, 자본론 제1권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다. 비스카르크(1815-1898)는 그 해에 프러시아 수상이 되었고, 링컨(1809-1865)은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위고의 생각에는, 마르크스의 생각처럼 생산수단을 국가에 맡기거나 자본주의 체제처럼 생산수단을 자본가에게 맡기거나, 노동자의 손에 생산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것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움직여서 혹은 크게 혹은 작게 생산 수단이 노동자의 손에도 나누어지는 것을 추진했다. 그의 평등 정신은 그가 혁명세력에 가담했다는 사실, 제2공화국 국회에서 한 연설, 그의 문학작품 등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의 꿈은 전혀 무용했다고 할 수 없다. 그 사람 혼지서 이룬 일은 아니지만, 현대의 크고작은 모든 주주와 자영업자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
프러시아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1943년부터 파리 거주를 시작했고, 파리에서 추방되어 벨기에 브뤼셀로 갔다가, 브뤼셀에서 추방되어 다시 파리로 갔다가, 1949년 파리에서 추방된 이후 죽을 때까지 런던에서 살았다. 1948년 초에는 브뤼셀 거주자이면서 런던에 가 있었다. 1847년 말, 마르크스가 속한 공산주의 연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공산당선언을 집필하도록 위촉했고, 1948년 이탈리아의 민중 봉기와 프랑스의 민중 봉기 사이에 그것을 발간하고 브뤼셀에서 추방되었다.
마르크스는 1849년 파리에서 추방된 후 런던에서 저술을 시작하여, 1867년에 자본론 제1권을 발간했다. 마르크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도서관에 드나들며 경제학을 구경했고, 그 경제학을 공산당선언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 애쓴 것이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저서에 경제학적 계산이 더러 보이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 했다.
칼럼 659호부터 668호까지 10개의 칼럼에서 본 바, 마르크스의 각종 계산은 현장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 수준이었다. 경제학의 계산은 학교 수업 중의 계산과는 다르다. 유용한 경제적 계산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줄의 계산에 천 번의 고민이 따라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계산이 단순한 상호관계를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표시하는 것인지, 그 계산이 맞아 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원인과 결과가 역류하는 일은 없는지, 확률의 개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등. 마르크스에게 경제학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경제학을 알고 모르고보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과잉생산의 문제였다. 후대의 케인즈도 어려워한 이 문제가 마르크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면, 마르크스가 그 허약한 계산력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경제학에 평생를 바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