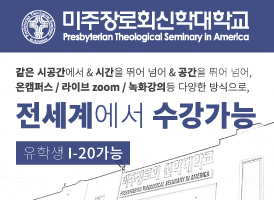바이든 아닌 트럼프 행정부였다면…尹비상계엄 대응 달랐을까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란 표현도 사용했다.
이 같은 반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미국의 외교적 대응이 달라졌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프렌치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비상계엄에 대해 다른 대응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때도 '내부의 적'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적대감을 표시해왔다.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연방정부 고위직을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였고, '반역자'나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공감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의 '스트롱맨' 지도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끌린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을 정도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민주주의 진영과의 동맹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FP 칼럼니스트 프렌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외에 다른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외교 전통이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립주의 외교로 급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프렌치는 주변 중동 국가들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나 관여하려고 할지 미지수라는 것이 프렌치의 주장이다.
ko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