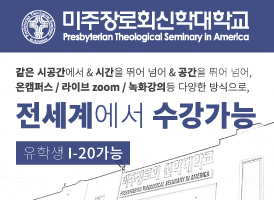Z세대 5명 중 1명 ‘우울증 경험’
인종차별·사회적 배제·불확실성 등 원인
문화 차이 반영한 치료 제공해야 효과
미국을 끌어갈 Z세대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7월 25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각종 통계 수치를 통해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 세대)가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사회 위기임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에 따르면 2023년 기준 Z세대 청년층의 22%가 주요 우울증세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실상 Z세대 5명 중 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고등학생의 36% 이상이 지속적인 절망감을 경험했다.
보스턴대학교 오사나 라퍼 박사는 “팬데믹 전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었다”며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ADHD) 등의 증세는 이제 유년기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을 기도하는 유색 인종 청소년들도 늘었다.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9~12학년 흑인 학생의 10.3%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했으며, 심각한 자살 고려 경험도 19.6%로 파악됐다. 라티노 학생과 백인 학생의 경우 각각 8.3%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치료는 인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5~17세 청소년의 정신 건강 치료율은 백인
18.3%, 흑인 12.5%, 라티노 10.3%였다.
전문가들은 이는 문화적 낙인, 치료 접근성 부족, 경제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재단 ‘옐로우체어콜렉티브’의 이수진 치료사는 “아시아계나 라틴계 커뮤니티에서는 정신 건강을 터놓고 말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청소년이 많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전문가 중 유색 인종의 비율은 6%에 불과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대 공공보건학과의 키아라 알바레즈 박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치료의 지속 가능성도 떨어진다”며 “다양성과 언어, 문화 감수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라퍼 박사는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타인의 삶을 비교하고 자신이 빠진 모임이나 활동을 확인하며 불안을 키운다. 이러한 디지털 피드백 연결고리는 자존감 저하, 수면 장애, 불안·우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입 경쟁을 중심으로 한 학업 압박, 부모의 기대 증가, 여가 시간 상실 등도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보호국 자문위원인 비러브드 빌리지(Beloved Village)의 자원봉사자인 빅토리아 버치는 본인이 경험한 청소년기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사회적 배제와 트라우마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버치는 “치유는 공동체, 특히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며 “처벌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회복과 통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